이효석은 수필 '낙엽을 태우며'서 낙엽을 '희망의 껍질' 묘사
나무들은 에너지 손실 최소화하려 몸부림 치는 생존의 전략

#한창일 때는 앙칼진 추위가 잘 벼린 창끝보다 날카로운 갈기를 세워 찔러 대도 외레 즐기는 편이었건만 이젠 바람소리에 조금만 쇳기가 있어도 더럭 겁부터 난다. 아~ 옛날이여다.
더구나 겨울산은 눈 뒷바라지로 응달진 구석쟁이마다 얼음 살이 박혀있게 마련이어서 햇살이 한참이나 퍼진 다음에 올라도 비척거리는 통에 늘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춥다고 움츠리기 시작하면 곧 구들장을 업게 되고, 이내 흙냄새를 찾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돋을 정도로 들어온 터라 한겨울에도 산으로 들로 쏘다니는 건 인이 박힌 지 또한 오래다.
느지막한 점심을 대충 때우고 뒷산에 오르니 동지를 갓 넘긴 겨울 해가 벌써 버얼건 노을을 뿌리며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리고 있다. 무에 그리 급한고. 하마 저도 추워 서둘러 지평선너머 제 집으로 가려나. 매일 다니는 길이건만 오늘따라 유난히 가파르게 숨이 찬다. 괜스레 맘이 급해진다.
마침 신갈나무에서 잎새 하나가 떨어져 나와 간들간들 낙하를 시작한다. 그가 내린 곳엔 낙엽이 수북수북하다. 낙엽이 모여 산다더니 정말이다.
#꽤나 데면데면한 사람이라도 겨울 산에 들면 누구든 시인이 된다. 낙엽 때문이다. 까무룩 찌푸리진 않더라도 늘 얼마만큼은 스산한 날에 푸르른 기색이라곤 한 푼어치도 없는 한겨울 산속에서 낙엽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철학이요 시이니까. 벌거벗은 나무들의 초췌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맞댄 낙엽의 푹신한 후덕이 오히려 짠한 것은 네 남할 것 없는 우리의 초상이기 때문일레라. 그 장하던 여름날의 푸른 기상은 어디로 가고 한없이 침잠하는 진한 갈색으로 누었거나 뒹구는 그 모습을 두고 한번쯤 제 인생을 곱씹지 않을 이가 있을까. 사랑이 쪽 나고, 배신에 데고, 병마에 시달리고…,어차피 삶이 고해(苦海)일지라도 신산(辛酸)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승의 끝자락으로 내몰리는 자신과 낙엽이 무에 다르리오. 김삿갓 형님이 봄에 꽃이 지는 것만 서러워하느냐 (낙엽이 지는 건 외면하고)며 봄새인 두견이더러 '인정머리가 야박하다'고 타박(杜宇爾何情薄物/ 一生何爲落花啼)하는 까닭이다. 스산한 조락(凋落)-.
일찍이 이효석이 수필〈낙엽을 태우며〉에서 낙엽을 '희망의 껍질'이라고 한 뜻도 다르지 않다. 생명들로 충만했던 초록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이기에.
하지만 그러기에 낙엽은 단지 죽어가는 과정일 뿐 결코 죽은 것은 아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주검이라면 나나 당신이나 한번쯤 값 싼 동정의 눈길을 던질 일이지 이리 도저하게 가슴 저린 탄식과 연민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뭇사람이 낙엽더러 '왜 생겼냐', '어디로 가느냐'며 묻는다. 낙엽 지는 오동잎한테 '수직의 파문을 내며 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는 만해(卍海)의 웅숭깊은 절규하며, '낙엽이 가는 길'운운하는 수많은 시인들의 노래는 늘 생생하다.
'떠나면서도 꿈꾼다는 것은/ 인간사에 없는 일/ 아, 낙엽이 봄을 만나러/ 천리를 굽이쳐 간다' -전군표의 〈낙엽의 꿈〉중에서.
역전이다. 낙엽한테서 되레 희망을 찾고, 보고, 급기야 만들어낸다.
#내가 이맘때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 나훈아의 〈낙엽이 가는 길〉이다. 심형섭이 작사 ㆍ작곡한 이 노래는 노랫말도, 멜로디도 여느 대중가요와는 다른 품격이요 이를 담백한 수채화처럼 담아내는 나훈아의 가창력이 극적인 앙상블로 빚어낸 수작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브 몽땅(Yves Montand)의 샹송 〈고엽(枯葉ㆍ원제 :Les Feuilles Mortes)〉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고엽〉이 이브 몽땅의 중후한 중저음에 가슴이 저려오는, 퇴폐미 깊은 울림이 있다면 〈낙엽이 가는 길〉은 아스라이 스러지는 빛의 슬픈 결말에 이타적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끝내 재회에 대한 한 자락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고엽〉이 낙엽의 내리막 분위기만을 진하게 그리고 있는 데 반해 〈낙엽이 가는 길〉은 내리막의 감상(感傷)을 오르막의 힌트로 열어 놓고 있음이라. 그건 전설적 비바 에디뜨 삐아프(Édith Piaf)가 부른 버전에서도 매한가지다. 다만 냇 킹 콜(Nat King Cole)의 영어 버전(Autumn Leaves)은 개사한 까닭일까, 분위기가 외레 〈낙엽이 가는 길〉과 통한다. 분위기로 치자면 이브 몽땅의 〈고엽〉은 배호의 〈마지막 잎새〉가 짝할 만하다. 《*매혹적인 부르스 기타 연주에 적당한 허스키 보이스로 읊조리는 에릭 클랩튼(Eric Clapton)의〈고엽〉도 만만치 않다!》
배호의 애수에 찬 저음이 훑고 간 그 자리엔 홀연 휘익 바람이 불어 누구라 할 것 없이 영락없는 빈 가슴에 벌거숭이가 되고야 마니까 말이다. 〈낙엽이 가는 길〉과 〈마지막 잎새〉는 50여년 불러제낀 베스트 애창곡이다.
#낙엽은 대화를 한다. 이때는 낙엽보단 가랑잎이란 호칭이 더 어울린다. 늦가을부터 산에 들면 어느 곳에서건 가랑잎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주 작은 바람기나 인기척이라도 있을라치면 여기저기서 말을 걸어온다. 생김새에 따라 제각각 소리의 색깔이며 크기가 다르다. 우리네 목청이 그러하듯이. 곱게 마른 것일수록 경쾌하고, 갓 떨어졌거나 물기 진 곳에 있는 놈일수록 찌걱거린다. 싸리나 아카시의 가랑잎은 뽀시락 뽀사삭 어린 계집애들 마냥 조잘거리고, 떡갈나무 가랑잎은 버석버석 낫 살 먹은 남정네의 퉁퉁대는 목소리를 낸다. 아예 굽은 채 엎어진 양버즘 가랑잎은 바가지 긁는 소리를 공명해낸다. 그런가 하면 솔가리도 낙엽이런가, 비천(飛天)이 남몰래 무봉(無縫)한 천의(天衣)를 벗는 소리를 잣는다. 습자지가 구겨지는 소리, 빨랫줄에 널어둔 광목이 울타리에 긁히는 소리, 잘 구워진 참숯끼리 부딪는 소리 등등. 오케스트라가 따로 없다. 프랑스 시인 구르몽(Remy de Gourmont)은 시〈낙엽〉에서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라고 물으며 '낙엽은 날개 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고 읊었다. 그는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상냥히 외친다.'면서도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고 생중계한다. 전희종 시인은 '낙엽 쌓인 오솔길을 걷다보면 혼자라도 혼자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삼희성(三喜聲· 학동이 책 읽는 소리,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담 넘어 들려오는 여인네의 다듬이질 소리)에 낙엽 소리를 얹어 사희성(四喜聲)을 주장한다. 까닭을 알만 하다.
#그렇다면 낙엽은 왜 생기는가? 과학적으로는 햇빛과 기온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나뭇잎과 나무사이에 떨켜가 만들어지고, 분리되는 나무의 생존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건 순 나무 편에 선 설명일 뿐 낙엽의 입장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이파리가 나무를 위해 떨어져 나가주는 건 아닐까? 너무나 사랑했기에 뭐 이런….또 과연 과학이란 게 말하듯 나무는 봄부터 거의 한 해를 동거해온 이파리들을 단숨에 손절하는 매몰찬 놈일까? 저만 살자고-. 오히려 잎새한테 '내 곁에 있어 달라 말도 못하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무정부르스〉는 아닐까?
#요즘 낙엽한테 몹쓸 짓을 자행(?)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 인도와 공원은 물론이고 웬만한 산의 둘레길엔 낙엽이라곤 한 장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맨들맨들하다. 그놈의 어싱(earthing)인가 뭔가 하는 바람이 불면서 맨발걷기 산보객을 위한답시고 죄다 청소를 하는 탓이다. 낙엽귀근(落葉歸根)이라고 제가 나고, 살던 나무의 밑자락에 몸을 뉘는 게 자연의 원칙이자 잎새들의 마지막 소원이거늘 이리도 사막한 폭력을 휘두른다, 인간들이-.
'낙엽을 쓸어버릴 일이 아니로세/ 날씨 창창한 밤에 낙엽 듯는 소리 듣기그만이니 (落葉不可掃 偏宜淸夜聞)'
매월당(梅月堂)이 보았으면 기함할 일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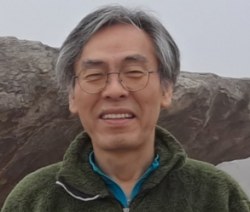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항공사에 다니다 1982년 중앙일보에 신문기자로 입사했다. 주로 사회부,문화부에서 일했다. 법조기자로 5공 초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철희ㆍ장영자 사건을 비롯,■영동개발진흥사건■명성사건■정래혁 부정축재사건 등 대형사건을, 사건기자로 ■대도 조세형 사건■'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유명한 탄주범 지강현사건■중공민항기사건 등을, 문화부에서는 주요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들을 시리즈로 소개했고 중앙청철거기사와 팔만대장경기사가 영어,불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 30개 언어로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엔 초짜기자임에도 중앙일보의 간판 기획 '성씨의 고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1990년대 초에는 국내 최초로 '토종을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종자전쟁에 대비를 촉구하는 기사를 1년간 연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토종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밖에 대한상의를 비롯 다수의 기업의 초청으로 글쓰기 강의를 했으며 2014인천아시안게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