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다양한 사회현상과 인간행위를 설명하는 도구로 '프레임' 활용
'내러티브'는 무한(無限)한 인간의 행위나 이미지 요소들 중 일부를 선택해 조리 있게 정리하는 행위나 그 결과물을 뜻한다.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구성된다는 '의미 구성(constructive)의 행위'와, 그 결과물로서 '스토리' 및 '플롯'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최근 유행하는 다른 용어와 쉽게 연계된다. 바로 '프레임(fram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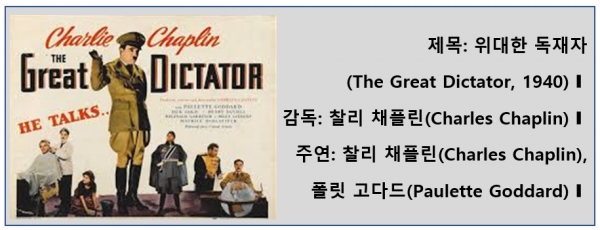
자, 눈을 감아 보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그려 보자. 히틀러도 떠오를 것이다. 이제 포커스를 그에게 맞춰보자. 히틀러. 그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나.
칫솔 콧수염, 장교용 바이저 캡(visor cap), 군용 트렌치 코트,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청중을 사로잡는 열정적 연설, 못마땅하다는 듯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부하들에게 내리는 신경질적인 지시, 오른 손을 앞으로 뻗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근엄한 군대 사열···.
강인하고 억세다. 전형적인 카리스마적인 리더의 모습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이것이 '히틀러의 모든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그도 사람인 이상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간다. 잘 때는 코를 골거나 입을 벌리거나 침을 흘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는 변비 환자이기도 했다. 화장실에서는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배변 장애의 고통과 목숨 건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 누구의 머릿속에도 없다.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내러티브' 개념을 생각하게 된다. 지난 회에서 설명했듯 '내러티브' 개념은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다. ➀인간의 행위나 이미지 요소는 무한하다. ➁따라서 누군가의 행위나 이미지를 설명해야 할 때는 불가피하게 무한한 이들 요소 중 일부를 선택해야 한다. ➂이때 선택되는 행위ㆍ이미지 요소는 각자의 생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➃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 '의미 구성적(constructive)'이라는 특성을 지적한다. ➄또한 우리는 이 '의미의 구성적 행위' 및 그 결과인 '스토리'와 '플롯' 모두를 '내러티브'로 부른다는 것이다.
이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무한한 행위ㆍ이미지 요소 중 누구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 당연히 말하는 자, 즉 화자(話者)인 것이다. 보통의 경우 이 의미 있는 행위ㆍ이미지 요소의 선택에서 화자의 의도성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것들을 선택해 조리 있게 상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일 뿐이다. '의미의 선택과 설명'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화자가 의식적으로 뭔가 의도를 갖고 의미 있는 요소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를 속일 때, 또는 상대방을 설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 일주일 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그날 뭐 했냐고 물으면 '살인'이라는 '중요한 행위' 대신 '영화를 봤다'거나 '친구를 만났다'는 덜 중요한 행위 요소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이다. 즉, 화자는 이런 건 빼고 저런 건 살짝 바꾸거나 만들어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곧 내러티브를 인위적으로 교묘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붙기도 한다. '내러티브 전략(narrative strategy)'인 것이다. 정치나 경영, 미디어 연구 영역에서 마케팅이나 PR 또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발달해 왔다. '상대방을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때로 이 말 안에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일부 사실을 빼고 더하고 살짝 바꿔 상대를 속이는 전략일 수 있다는 의미다.
■ '내러티브'는 '프레임'이다?
이 개념은 또한 전혀 다른 맥락에서 발전해 온 또 하나의 개념과 겹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유행어처럼 널리 퍼진 개념, 바로 '프레임(frame)'이다. 통상 이 개념은 인류학자 겸 언어학자인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이 1954년 발표한 논문 "유희와 환상에 관한 이론"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 베이트슨은 프레임을 다음처럼 규정했다. 즉, "특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의미를 갖는) 상호작용하는 메시지 묶음의 결합체(spatial and temporary bounding of set of interactive messages)"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보라. 그 게임 안에는 술래와 술래를 터치해야 하는 아이들 간 '규칙(rule)'이 있다. 이 '규칙'은 술래와 다른 아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작은 '묶음(set)'으로 돼 있다. 이 '묶음'의 모든 '결합체(bounding)'가 그 게임 전체를 구성하는 '프레임'이 된다는 얘기다. 당연히 이 '프레임'은 게임을 하는 바로 그 지점과 시점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누군가 그 시공간을 떠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쳐도 게임은 성립될 수 없다.
이 같은 '규칙'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게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도 이 '규칙'은 매우 중요하다. 길에서 어른을 만나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게 우리 사회의 '규칙'이다. 만일 한 청년이 길에서 만난 아버지 친구 분께 반갑다며 어깨를 토닥거린다고 생각해 보라.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다. 그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 실제 베이트슨은 이 개념을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사례에 적용시켰다. 이 말은 곧 이 '규칙'을 인지하고 지켜야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사회적 성격을 갖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사회학계에서 그냥 둘리 없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은 베이트슨의 프레임 개념을 그대로 사회학에 들여와 다양한 사회현상과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도구로 썼다. 식탁 위에 붙어 있는 초인종과 아파트 문 옆에 붙어 있는 초인종의 기능 차이를 알려면 그 둘이 갖는 서로 다른 '규칙' 즉 '프레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사회학 내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현상학적 사회학'의 맥락에서 발전해 왔다. '프레임' 개념이 '생활세계'나, '당연시의 세계', '일상의 세계' 등 현상학적 개념과 연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프레임' 개념은 정치나 미디어 분야로 옮겨 가면서 새로운 측면이 부각된다. 사실 프레임이 갖는 '규칙'의 성향은 곧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언어로 전환되고 언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은, 무한대의 행위 중 의미 있는 것만을 추려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러티브의 의미이며 또한 프레임 개념이라는 말도 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행위'는 화자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상대방이 내 의도대로 사물을 봐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는 뜻이다.

영화의 '랙 포커스(Rack Focus)' 기법을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쉽다. 렌즈의 조리개를 활용해 포커스를 이동시키는 이 기법은 '전경(figure)'과 '배경(ground)'을 자유자재로 옮기며 관객의 시선을 감독의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더 쉽다. 1999년 라나ㆍ릴리 워쇼스키(LanaㆍLily Wachowski) 감독이 만든 <매트릭스>의 공중전화 신을 보라. 공중전화기에 맞춰져 있던 포커스는 천천히 부스 밖에 있는 트리니티에게 옮겨간다. 전화기에 있던 관객의 '시선'이 여주인공 트리니티에게 옮겨가는 것은 필연이다.
'정치적 내러티브(Political Narrative)'나 '정치 프레임(Political Frame)' 등의 개념에는 이 같은 '시선유도'의 특성이 강조돼 담겨 있다. 또한 이 특성이 언론보도에 적용되면 '뉴스 내러티브'나 '뉴스 프레임'이 된다. 이 용법을 영화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까? 당연하다. 영화 속의 내러티브나 프레임은 한편으로 당연하고 한편으로 자연스럽고 한편으로 필연적이다. 내러티브나 프레임 없는 영화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유도'에도 정도가 있다. '유도 방식'이 교묘하고 특별히 강조된 영화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영화 <위대한 독재자>는 어떨까?
--------------------------------------------------------------------

이재광이코노텔링 대기자❙이코노텔링 대기자❙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사회학(고려대)ㆍ행정학(경희대)박사❙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욕주립대 초빙연구위원, 젊은영화비평집단 고문, 중앙일보 기자 역임❙단편소설 '나카마'로 제36회(2013년) 한국소설가협회 신인문학상 수상❙저서 『영화로 쓰는 세계경제사』, 『영화로 쓰는 20세기 세계경제사』, 『식민과 제국의 길』, 『과잉생산,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 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