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광고나 PR은 물론 심지어 패션 업계등에서도 폭 넓게 차용돼
일상 중 '중요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를 간추린 작업의 하나
영화 <위대한 독재자>. 제작 단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모던 타임스> 등 채플린의 몇몇 영화도 그랬지만 <위대한 독재자>는 그 정도가 심했다. 작업을 시작한 1938년부터 영화를 개봉한 1940년까지의 2년여를 생각해 보라. 그 사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런데 <위대한 독재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히틀러였다. 말도 탈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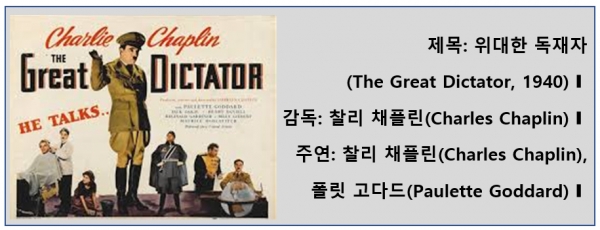
지난해 9월 첫 방송을 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히트를 쳤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러자 언론은 이렇게 말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새 역사를 썼다"는 것이다. 어떤 언론은 "역사책에 기록됐다"고도 썼다. 지난해 3월 개봉된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했다. <미나리>는 저예산 독립영화다. 그럼에도 내로라하는 상을 휩쓸었다. 특히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은 <미나리>가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책에 기록되다, 새 역사를 쓰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 의문에 오히려 의문을 던질 분이 많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고 있어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 '당연한 것'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2020년 1월 1일 A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됐다. 개봉관은 1곳, 관객도 1명이었다. 2월 1일과 4월 6일 개봉된 영화 B와 C도 그랬다. 개봉관 1곳, 관객 1명이었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발간된 『2021 영화연감』에 수록됐고, 당연히 2020년 관객동원은 밑에서 '1등'이었다.
질문. 이들에게도 "역사책에 기록됐다"거나 "새 역사를 썼다"는 말을 할까? 또는 할 수 있을까? 논리대로라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역사책'인 '연감'에 수록됐고 관객동원에도 '신기록'을 수립했다. 모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한 해 동원관객 1명인 영화가 세 편이나 됐다는 '사실'도 '새 역사'일지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 알 듯, 현실은 다르다. 이들 영화에 "역사책에 기록됐다"거나 "새 역사를 썼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비웃음을 받을 게 뻔하다. 어쩌면 '반어법'으로 영화를 모욕했다며 욕할지도 모른다.
■ "새 역사를 썼다"의 진짜 의미는?
왤까? 또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렇다. "역사책에 기록됐다"거나 "새 역사를 썼다"는 표현은 '진짜로 역사책에 기록됐거나 새 역사를 쓴 사람ㆍ사건'에 대한 게 아니다. 박수를 칠 만큼 훌륭하고 좋은 사람ㆍ사건에만 쓴다. 히틀러에게 "새 역사를 썼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부'라는 '역사책'에 기록되며 새 역사를 쓴다. 영화도 마찬가지. 모든 또는 대부분의 영화는 '연감' 등 역사책에 기록되며 '몇 년도 몇 번째 태어났다'는 새 역사를 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중 '훌륭한 영화'에만 그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인문ㆍ사회과학 개념 하나와 조우하게 된다. 바로 '내러티브(narrative)'다. 아주 오래 전부터 쓰인 이 개념은 일반 용법에서도 혼선을 빚는다. 누구는 스토리와 같고 누구는 플롯과 같고 누구는 이 둘을 합친 것과 같다고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하다. 영화에서는 사운드나 미장센을 내러티브 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문학의 내러티브 개념과 다르다.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담론(Social Discourse)'의 유사 개념으로 '사회적 내러티브(Social Narrative)'라는 용어를 쓴다. 나아가 광고나 PR은 물론이요, 심지어 패션업계조차 이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차용해 쓰고 있다.
그래서일 것이다. '내러티브'라는 개념은 마치 '자본주의'나 '문화'나 '거버넌스(governance)'처럼 개념 규정 없이 사용되는 일이 많다.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주로 문학적 개념으로 쓰이던 이 개념이 점차 TV나 영화, 마케팅ㆍPR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각 영역에 적합한 의미로 바뀌었다. 같은 용어라 해도 각 분야의 맥락을 모르면 핵심을 포착하기 쉽지 않다. 광범위하게 쓰이는(외연의 확장) 개념은 의미를 한정하기 어렵다(내포의 축소). '내러티브'라는 개념이 혼란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내러티브'는 '스토리'나 '플롯' 등 전통적인 문학 개념과 연관돼 쓰였다. 그러다 1960년대 시작하고 1990년대 본격적으로 세(勢)를 확장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새로운 의미가 강조됐다. 바로 '구성적(constructive) 의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절대주의'를 깨는 사상ㆍ예술 조류다.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전통 스토리'에 대해 '절대적 의미'가 아닌 '구성적 의미'를 강조하며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김대우 감독의 2010년 작 <방자전>을 보라. 요즘 쓰이는 '내러티브'라는 용법에는 이 '구성적 의미'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느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시간은 아날로그로 흐른다.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행위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즉, 무한(無限)하다.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가슴에 손을 대 보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심장은 뛴다. 쉬지 않고 뛴다. 밥 먹을 때도 뛰고 잠잘 때도 뛴다. 1분에 60~100회나 뛴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 A가 "오늘 뭐했냐"고 묻는다 치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친구 B를 만났다"거나 "학교에 다녀왔다"거나 "공부했다"거나 심지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이다.

왤까?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하루 사이 벌어지는 우리의 행위 요소는 무한하다고 했다. 따라서 '오늘 하루'에 벌어진 일들, 즉 무한한 우리의 행위를 모두 말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무한의 일상 행위' 중 극히 일부를 '간추려'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한의 일상 행위' 중 우리는 무엇을 간추려 말을 하는 것일까? 결론. 자기 생각에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들이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무한 행위 요소' 중 스스로 '중요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를 '간추리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무한의 행위 요소 중 일부를 간추리는 것', 이것이 '구성'이 갖는 의미요, 이렇게 '구성돼 나온 말'이 '내러티브'인 것이다. 또한 이 '말'은 앞뒤 조리가 있어야 하니, 이 '말'은 곧 '이야기(story)'가 되는 것이며, 앞뒤 조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짤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플롯(plot)'이 되는 것이다. '행위' 대신 '이미지' 등 시각 요소나 '패션' 등 객관적 실체에 적용해도 이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의 1940년 작 <위대한 독재자(The Great Dictator)>는 제작 단계부터 말이 많았다. 모국인 영국과 주 활동 무대였던 미국 정부로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무언(無言)의 압력을 받았다. 개봉 뒤 반응 역시 상상을 초월했다. 세계 곳곳에서 격렬한 찬사와 비난이 쏟아졌다. 심지어 '상영불가'를 외치며 필름을 훔쳐가는 일까지 생겼다. 그게 다가 아니다. 영화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분분하다. 이 영화,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문ㆍ사회과학적 지식이 필수다. '내러티브'는 그 첫 걸음일 뿐이다.
----------------------------------------------------------------------

이재광 이코노텔링 대기자❙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사회학(고려대)ㆍ행정학(경희대)박사❙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욕주립대 초빙 연구위원, 젊은영화비평집단 고문, 중앙일보 기자 역임❙단편소설 '나카마'로 제36회(2013년) 한국소설가협회 신인문학상 수상❙저서 『영화로 쓰는 세계경제사』, 『영화로 쓰는 20세기 세계경제사』, 『식민과 제국의 길』, 『과잉생산,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 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