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 5월 개봉된 감독 데뷔작 ' 비를 만나다 ' 등 대히트
몸값 크게 뛰어 … 검소한 생활로 '수전노 오명' 시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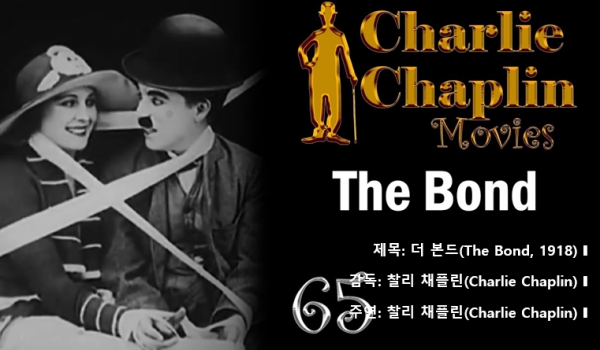
지난 회에서 말했듯 '역사 속 우연'은 '타이밍', 즉 '때'의 문제다. 영화 <국가의 탄생>의 '때' 역시 묘하다. 촬영이 시작된 1914년 7월 4일은 사라예보 사건이 터진 뒤 6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리고 촬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마른 전투에서 패한 독일이 심기일전(心機一轉) 후 벨기에에서 벌인 제1차 이프르 전투(Battle of Ypres, 1914. 10 19.~11. 22)가 한창이었다.
이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숱한 전투 중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독일군 8만에 연합군 5만 등 모두 13만 명의 사상자를 낸 참혹한 전투이기도 했지만 이 전투를 계기로 기동전은 본격 참호전으로 바뀌게 된다. 전술적 변화를 가져온 전투였던 것이다. 이처럼 영화사를 바꾼 영화의 탄생과 세계전쟁의 '때'는 묘하게 일치한다.
■ 조국 전쟁에도 채플린은 승승장구
그러나 영화계가 부여하는 1914년의 의미는 비단 영화 <국가의 탄생>의 탄생에 그치지 않는다. 영화계는 이 해에 태어난 <국가의 탄생> 못지않은, 또 하나의 대단한 '탄생'에 축가를 보낸다. 이 탄생가(誕生歌)의 주인공은, 영화사 전체를 통해 불세출의 이름을 남긴 불멸(不滅)의 배우 겸 감독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이다.
그해 그는 '극단인(劇團人)'에서 '영화인'으로 거듭났다. 당시 그는 영국의 일류 희극단 프레드 카노(Fred Karno)의 일원으로, 당시 미국 순회공연 중이었다. 그러던 그가 1913년 12월 키스톤 영화사(Keystone Cops) 소속의 감독 겸 배우 맥 세네트(Mack Sennett)의 스카웃 제안을 받아들여 1914년 드디어 영화인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영화인으로 첫 선을 보였던 1914년, 그는 연속적으로 자신의 '최초' 기록을 만들어내며 그야말로 '전설'을 써내려 간다. 그해 2월 2일 개봉됐던 영화 <생활비 벌기(Making a Living)>는 그가 출연한 첫 영화로 기록되고 있으며, 닷새 뒤인 2월 7일 개봉된 영화 <베니스에서의 어린이 자동차 경주(Kid Auto Races at Venice)>는 이후 그의 전형적인 캐릭터가 된 '떠돌이 찰리'를 처음 선뵌 영화로 기록된다. 짧은 콧수염에 큰 신발과 헐렁한 바지, 짧고 꽉 끼는 코트, 손잡이가 굽은 지팡이(cane), 작은 더비 모자······. 오늘날 만인이 알고 있는 채플린의 이미지가 바로 이 영화에서 탄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해 5월 4일 개봉된 <비를 만나다(Caught in the Rain)>는 그의 감독 데뷔작으로 남아 있다.

이해에 그가 만든 기록은 그저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 그에게 엄청난 명성과 상업적 성공을 가져다줬다. 데뷔작부터 성공작이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첫 영화 <생활비 벌기>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언론은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에게 '1류 코미디언'이라는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이미 '대스타'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 6월 11일 개봉한 <녹아웃(Knockout)>에서는 2분 분량의 단역으로 출연했음에도 영화사는 '채플린 영화'라고 광고했을 정도. 그는 모국 영국에까지 이름을 알렸다. 그해 6월 런던의 극장들은 채플린의 영화 7편을 상영했고 그곳의 관객과 언론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다.
당연히 '돈'도 벌었다. 1914년 키스톤 영화사에서 주당 150달러를 받기로 했던 그는 1년 뒤 에세네(Essanay) 영화사로 옮기며 주당 1250달러를 받기로 했다. 연봉이 무려 8배나 뛰었던 것이다. 여기에 1만 달러의 보너스는 '별도'였다. 그해 8월 9일 그가 런던의 이복형 시드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신이 이룬 성취에 도취돼 있었다. 미국으로 와 함께 생활하자는 내용의 편지에는 자신의 엄청난 '인기'와 '돈'에 대한 자랑으로 도배가 돼 있을 정도였다. 편지에서 그는 '주급 500달러'를 제안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몇 달 뒤 그는, 그 두 배가 넘는 주급 1250달러를 받으며 에세네 영화사로 옮겼다. 편지의 주요 내용을 보자.
8월 9일 일요일, 시드 형에게,
<중략> 형, 난 해 냈어. 극장마다 내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있지. '오늘 찰리 채플린 상영'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 나라에서 난 엄청난 흥행수입을 올리는 인물이 됐다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인기를 얻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내년에는 큰돈을 벌고 싶어. 난 주급 500달러에다 보수로 주식 40%(그것은 주급 1000달러 정도가 되는데) 등 온갖 제의를 받았어. ······ 난 시내에서 백만장자들이 들락거리는 최고의 클럽에 묵고 있어. 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지. 꽤 화려하게 사는 편이야. 내게는 전속 사환까지 딸려 있다고. <중략>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 우선 편지를 쓴 날짜다. 1914년 8월 9일이다. 당시 유럽 상황은 무척이나 급박했다. 8월 1일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3일에는 프랑스에 대해 선전포고했고 다음날인 8월 4일에는 바로 실력행사에 돌입, 벨기에를 침공했다. 그리고 당일 채플린의 모국 영국이 독일에 전쟁을 선포했고 8월 7일에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전쟁이 터졌다. 채플린이 그의 형에게 쓴 편지는 독일의 벨기에 침공으로 말로만 오가던 전쟁이 '현실'이 된 뒤 5일이 지난 후였다. 유럽에서 터진 참극과 채플린에 터진 '대박' 간에 묘한 대조를 느끼게 된다.
만일 그리피스나 채플린이 미국 아닌 유럽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그 같은 성취를 얻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만일 이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또는 오스트리아나 벨기에에서 활동했던 영화인이었다면 1914년 8월 이후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피스는, 편집은 둘째 치고, 촬영조차 중단했어야 했을 테고 채플린은 영화계에 막 뜨려던 '반짝 스타'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1875년생인 그리피스는 당시 서른아홉의 나이에 기혼이어서 징집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1889년생인 채플린은 당시 스물다섯으로 100% 징집 대상이었다. 수천만 명이 희생된 참혹한 전쟁에서 그가 멀쩡하게 돌아오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채플린에게 다행인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그가 영국 국적을 갖고 있었으며 미국에서 활동했다는 점이다. 전쟁 초기 영국은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 중 유일하게 징집이 아닌 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봤고 징집에 대한 정치권 일부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아무리 지원제로 운용된다 해도 영국이라면 활동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립을 선언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일단 '남의 일'이었다. 유럽에 비해 활동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전쟁을 낙관했던 영국 국적이었다. 본국으로부터의 소환도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 채플린, "형은 전쟁에 나가지 마"
채플린은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편지 말미에 그가 쓴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곳에서 형이 전쟁에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 이번 전쟁은 끔찍해. 모든 뉴스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게 다다. '전쟁이 끔찍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 세상 걱정, 나라 걱정, 이웃 걱정, 친구 걱정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형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까지 당부한다. 이 글 앞에는 전쟁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께 돈을 보내야할지 물었고, 이 글 뒤에는 자신이 최근 만든 영화와 출연 여배우 마리 드레슬러(Marie Dressler)를 자랑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해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차를 가져와 기다린다며 편지를 끝낸다.

이쯤 되면 채플린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도 좀 식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그는 잘 나갔다. 1914년 말 엄청난 주급과 보너스를 챙기며 시카고 에사네이 영화사로 자리를 옮긴다. 또 해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돈을 챙긴다. 2월 1일 개봉된 <그의 새 일자리(His New Job)>를 시작으로 그는 월 2편씩 영화를 내놓았다. 그러다, 마침내, 그해 4월 11일, 바로 그 영화, <떠돌이(The Tramp)>가 선을 보인다. 이 영화는 영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스토리 구성에서 촬영 기술까지 채플린 영화가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다른 한편 우스꽝스러운 외모에 '떠돌이' 개념이 더해진 그만의 캐릭터가 완성된 영화라는 평도 받는다.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그의 일대기를 쓴 데이비드 로빈슨은 "1915년은 채플린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해"로 기록한다. 신문마다 그에 대한 만화나 시가 게재됐고 채플린 인형이나 장난감등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이 같은 신화는 1916년에도 계속됐다. 1916년 2월 26일 채플린이 뮤츄얼 영화사와 맺은 계약은 충격적이까지 했다. 주급 1만 달러에 보너스 15만 달러. 연봉으로 따지면 67만 달러에 이른다. 겨우 스물여섯의 나이에 재벌급 이상의 연봉을 받았던 것이다. 키스톤 영화사에서 받은 주급이 150달러였으니 2년 사이 연간 수입은 83배나 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다. 잘 나가던 그에게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1916년 들어 시련은 겹겹이 쌓여갔다. 가장 먼저 그를 괴롭혔던 것은 '돈'이었다.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이 문제. 뮤츄얼 영화사와 계약한 다음 날인 2월 27일, 보스턴의 한 교회 목사가 그를 주제로 설교하며 "만약 채플린이 청교도 시절에 살았다면 그를 마술사로 여기고 목숨을 빼앗았을 것"이라 말하며 "오늘날 미국의 삶에서 가장 큰 과오는 돈을 투기하는 이 사악하고 반윤리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때부터 채플린에게는 '수전노(守錢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낭비를 자제하는 소박한 삶의 양식이 그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시련은 연이어 터졌다. 다음 달인 3월 22일 런던의 타블로이드 신문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그가 진실로 두려워했던, 그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바로 병역 문제였다. 사실 뮤츄얼사와 계약 내용에는 전쟁이 지속되는 한 채플린이 영국에 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영국에 갔다 자칫 군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는 영화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었기 때문이다. '데일리 메일'은 바로 이 부분을 폭로했던 것이다. 신문은 "(미국의 몇몇 기업들은) 돈벌이를 위해 영국 인사에게 조국을 위해 싸우러 귀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게 했다"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채플린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재광이코노텔링 대기자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사회학(고려대)ㆍ행정학(경희대)박사❙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욕주립대 초빙연구위원, 젊은영화비평집단 고문, 중앙일보 기자 역임❙단편소설 '나카마'로 제36회(2013년) 한국소설가협회 신인문학상 수상❙저서 『영화로 쓰는 세계경제사』, 『영화로 쓰는 20세기 세계경제사』, 『식민과 제국의 길』, 『과잉생산,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 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