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 LCD 등 생산 넘쳐 관련기업들 울상
과잉생산 경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미국, 일본 등 주요국 국가부채 위험 수위
중국에서의 과잉생산이 문제란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로 세계 기업들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동안 좌파 경제학자들은 과잉생산을 자본주의의 특성이며 체제 붕괴의 주범으로 지적해 오지 않았나. 공산주의 나라에서 과잉생산이라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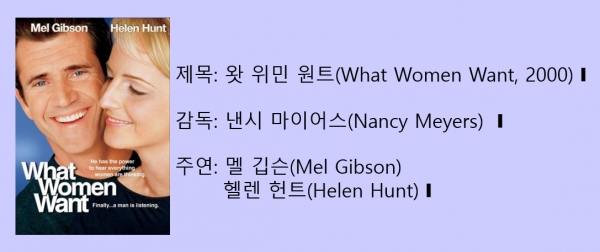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 액정표시장치(LCD), 반도체 웨이퍼….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다른 나라 관련 기업이 다 죽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산업들이다.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주로 중국이 서방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다는 세 가지 분야, 즉 '신삼양(新三樣)'이 그 중심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LCD, 반도체 웨이퍼 등 주요 중공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저가 공세가 심각하다. 세계는 경기침체로 내수가 어려워지자 중국이 저가ㆍ밀어내기 수출에 사활을 건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일상 용품시장에서는 더 하다. 상상하기 어려운 초저가 상품을 탑재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보라.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쉬인(SHEIN)….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라는 슬로건에서 이들의 저가 판매 전략을 알 수 있다. 일반 판매가보다 적게는 20~30%, 많게는 80~90% 싸다. 보통의 기업들은 당해낼 수가 없다. 이 역시 "과잉생산의 결과"라며 세계 유통ㆍ생산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 '과잉생산' … 한때 쓰기도 어려웠던 좌파 용어

일당독재의 전형인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과잉생산이라니! 우리는 지금 대단한 역사ㆍ이론의 아이러니를 목도(目睹)하고 있다.
비록 몇몇 잔가지 이론도 없지 않지만, 주류 마르크스 이론은,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의 독특한, 그리고 불가피한 산물이며 그로 인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고 본다.
지금도, 소수지만, 마르크스 이론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과잉생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도산(倒産)'을 예측하고 기대한다.
'한때'였지만, '과잉생산(overproduction)'이란 용어 자체를 쓰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다. 따라서 용어 자체가 혁명을 추구하는 급진 좌파나 공산주의자를 표상(表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과잉생산 주창자=마르크스주의자'라는 등식이 있었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나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에게도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워낙 냉전의 골이 깊어 용어 자체에 대한 반감이 컸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 전문가는 물론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언론에서도 이 용어를 거리낌 없이 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우선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상황이 소멸됐고, 이로 인해 음지에 있던 마르크스 이론이 양지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잉생산' 현상 자체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수시로 과잉생산 현상이 불거지니 주류경제학에 익숙한 학자나 전문가들도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저가 상품 밀어내기가 심해지고 있다. 대중을 상대로 한 언론에서까지 이 용어를 애용하게 된 배경이다.
중국에서 비롯된 과잉생산은 요즘 제기되는 과잉생산의 핵심 논제다. 하지만 생각할 게 많다. 첫째, 중국경제를 공산주의 경제로 볼 수 있는가, 둘째, 중국의 저가 공세를 과잉생산의 결과로 봐야 하는가, 셋째,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또는 공산주의에만 있는가, 넷째, 중국의 저가 공세가 없다면 상품의 과잉생산 문제는 없는가 등이다. 역사, 이론, 현실 등이 중첩돼 있어 '예스(yes)'와 '노(no)'를 똑 부러지게 말하기 쉽지 않다.
만일 실제로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나라'에서 '과잉생산'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론에 목숨까지도 거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서 말했듯 '과잉생산'이란 '자본주의 체제 고유의 특성'으로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 붕괴 이후 등장하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는 그야말로 '과잉생산'이란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마르크스가 살아 있다면 그는 《자본론》을 새로 써야 했을 것이다.
■ 마르크스, 《자본론》 새로 써야

필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참고해야 할 게 많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오래 전, 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꽤 깊이 탐구한 적이 있다. 2008년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정책학보》에 실었던 논문 "과잉생산경제와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기원에 관한 소고"와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단행본 《과잉생산,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를 쓰면서다. 그 내용 중 '과잉생산' 부분만 간단히 추려보자.
① 제2차 세계대전 후 호황을 누리던 기업은 1970년대 초, 비록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만성적 과잉생산'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활로를 모색한다.
② 이 '활로 모색'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마케팅' 개념과 기법이 등장한다. 마케팅은, 궁극적으로, 기업 사이에는 '과잉경쟁'을, 소비자에게는 '과잉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이들 '과잉경쟁'과 '과잉소비'는 기업과 가계의 '과잉부채'로 귀결된다.
③ 기업과 가계의 '과잉부채'는 수시로 경제위기를 부추기며, 그때마다 국가가 최종 대부 책임자로 나서 위기를 해소한다.
④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국가 역시 '과잉부채' 상황으로 치닫는다. 결국 '과잉생산'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 국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과잉부채'로 이어진다. 단, 전쟁 등의 특수 상황에서는 국가부채가 우선적으로 확대되면서 위기를 부르기도 한다.
⑤ '과잉생산' 현상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옳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은 '마케팅'이라는 '과잉생산의 해소 방식'을 고안해 낸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예단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⑥ '과잉생산' 체제는 국가가 부채를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만 유지된다. 그러나 국가가 부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곧 자본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 등을 통해 과잉생산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자본주의 기업은 '마케팅'이라는 경영기법을 고안, 과잉생산 체제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솔직히 정치학자나 행정학자, 사회학자,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른다. 접근방식도 마케팅에 대한 활용을 고려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 필자가 보기에, 기업의 마케팅 기제는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체제 해소를 위한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 글에서는 영화 <왓 위민 원트(What Women Want)>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룬다.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에 장기가 있는 낸시 마이어스(Nancy Meyers)이 2000년 발표한 미국영화다. 1980~90년대 <러셀 웨펀(Lethal Weapon)> 시리즈로 유명세를 탄 멜 깁슨(Mel Gibson)과 1997년 개봉된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As Good As It Gets)>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헬렌 헌트(Helen Hunt)가 주연을 맡았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마케팅이 어떻게 현대 과잉생산경제 체제를 유지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둘째, 지금의 과잉생산 경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필자는 이에 대해 "국가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했다. 지금 주요 나라의 국가는 나라 전체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필자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본다. 미국, 일본 등 주요 나라의 국가는 나라의 부채를 감당하기 버겁다. 이런 시각이라면 지금의 과잉생산 경제 체제는 오래 못 간다. 그렇다면 그 궁극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이 글은, 다소 모호하고 아련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케치를 제시하려 한다.
-------------------------------------------------------------------

이재광 이코노텔링 대기자 ❙ 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사회학(고려대)ㆍ행정학(경희대)박사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욕주립대 초빙연구위원, 젊은영화비평집단 고문, 중앙일보 기자 역임 ❙ 단편소설 '나카마'로 제36회(2013년) 한국소설가협회 신인문학상 수상 ❙ 저서 『영화로 쓰는 세계경제사』『영화로 쓰는 20세기 세계경제사』『식민과 제국의 길』『과잉생산,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 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