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예견해 연준 설립 '음모론'에 힘 실어줘…"역사는 '스토리'가 더 중요"시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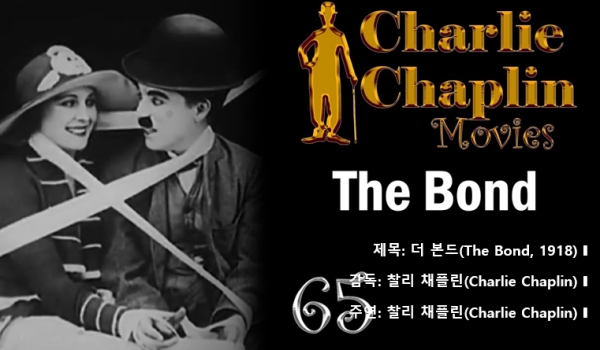
■ 연준 없이 치러졌을 전쟁, 생각도 싫다!
전운(戰雲) 감도는 유럽. 하지만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다. 미국의 엘리트라면 그 필요성을 역설했을 것이다. 유럽에서 전쟁이 터질 것 같고, 우리도 참전하거나 아니면 우방국에 차관이라도 제공해야 할 텐데, 그럼 자금을 끌어오거나 운용할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중앙은행 없이 한 나라 경제를 이끄는 것이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제1차 세계대전 중 월스트리트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했던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과의 E. W. 캐머러(Kemmerer) 교수의 말을 들어 보자.
"연방준비은행들(FR-Banks)은 ······ 우리가 금보유고를 지키는데, 외환을 규제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금융 역량을 총집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우리가 종전과 같은 분권화되고 낡은 금융제도를 그대로 두고 전쟁을 치렀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한 마디로, 연준이 없었다면, 국부(國富)를 지키는 것은 물론 전비조차 마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연준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가 말이다. 이 같은 상황 이해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했던 타임 테이블을 보면 누군가가 전쟁을 예견하며 치밀하게 중앙은행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전쟁 발발 6개월 전 연방준비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전쟁 발발과 거의 동시에 중앙은행이 본격 가동된다. 중앙은행이 생기고 3개월 뒤 폐쇄됐던 증권거래소가 다시 개소됐고 미국의 참전과 동시에 전쟁채권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이 모든 것을 이끌었던 재무장관 매커두가 기다렸다는 듯 장관 자리를 그만 둔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연준과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음모론'이 나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수상쩍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스티스 멀린스(Eustice Mullins), 윌리엄 엥달(William Engdahl), 쑹훙빙(宋鴻兵) 등이 이 같은 '음모론'을 펼치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 이들의 논리를 풀어 보자. 물론 개인별 차이도 있고 전체 또는 부분적인 논리적 비약도 없지 않아 몇 마디로 요약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는 엮을 수 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①전쟁은 거대 금융 자본가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다.②따라서 전쟁 발발 시는 물론 전쟁 이전에도 전쟁 준비를 위한 국채 발행을 부추긴다. ③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금융 자본가들의 모략으로 정부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고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다. ④이 같은 금융 자본가들의 의도는 대체로 중앙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⑤미국도 연준 출범 이후 유럽과 미국 정부에 엄청난 자금을 대주고 이익을 챙겼다. ⑥러시아 혁명도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금융 자본이 뒷돈을 대줬다.⑦연준이 없었다면 제1차 세계대전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전쟁이 거대 금융자본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다? 이 주장은 제1차 세계대전과 유럽의 금융자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허구성이 바로 드러난다. 전쟁으로 유럽의 금융자본은 초토화됐던 것을 상기해 보자. 전쟁은 일부의 금융자본가에게 이익을 줬을 뿐이다. 러시아 혁명과 미국 참전의 관계는 지난 번 글에서 이미 썼으니 여기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간단하게 말하면 윌슨의 '러시아 혁명 예찬론'은 혁명의 초기 상황에서 온건한 임시정부가 정책을 이끌었던 때 이뤄진 것이었다. "연준이 없었다면 제1차 세계대전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음모론'의 대표적인 주장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다 할 근거가 없어 답답할 정도다.
■ '우연'은 신의 섭리? 인간의 음모?
그렇다면 이 같은 '우연의 역사'를 헤겔의 역사철학 추종자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이와 직접 관련된 연구를 본 적은 없어도 대충 짐작은 간다. 헤겔의 말대로 '현상으로 드러난 사건들'로부터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역사의 본질'과 '신의 섭리'를 봐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들에게 '역사'는 궁극적으로 '신의 작품'이며 따라서 결국 '그의 이야기(His Srory)'가 된다. 이 같은 기독교적 역사관은,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서 출발했으며, 5세기 초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가 기초를 닦았다. 역사를 '신의 계시'로 본 그가 저서 『신국론(神國論)』에서 전개한 역사관이 '역사철학'이냐 '역사신학'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해도 그를 '헤겔식 역사철학의 원조'로 보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종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확실히 ▶연준의 출범과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혁명의 '우연성'은 '신의 계시'라 부를 만하다. 이들 세 개 사건들은 별도의 추동 세력이 주도한, 따라서 그 '추진의 궤(軌)'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들이다. '연준의 출범'이 미국 금융자본가들이 추동한 것이라면,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적 탐욕의 궁극의 결과였다. '러시아혁명'은 감당할 수 없는 차르의 전쟁에 휘말려 고통을 겼었던 노동자ㆍ농민의 울분과 이를 이용한 소수 공산주의 세력의 추진 결과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로 뒤얽혀 광범위한 세계사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시각에서의 역사 탐구자'들은 '음모론'이나 '헤겔식 역사철학' 모두를 거부한다. '음모론'의 경우 논리적 빈약성과 역사적 근거의 취약함 등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헤겔식 역사철학'은 경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즉, 우리가 경험적으로 맞다거나 틀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칼 포퍼(Karl Popper)의 표현을 빌리면 '반증가능성(反證可能性, Falsifiability)'이 낮거나 아예 없다는 얘기가 된다. 헤겔의 역사철학은 말 그대로 '철학' 또는 '신학'의 영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학'이라는 '낮은 곳'으로 오기에는 그 위치가 너무 높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장을 보자.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이 '우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음모론'처럼 복잡하지도, '역사철학'이나 '역사신학'처럼 어렵거나 추상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매우 간단하고 쉽다. 부사 하나면 끝난다. '마침', '때마침', '우연하게도', '우연치 않게' 등의 부사 하나면 족한 것이다. "마침 미국은 연준이 출범한 직후여서 전시(戰時)의 경제 통제가 비교적 용이했다"는 등의 표현이 이 '거대한 우연'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다. '음모론'이나 '역사철학' 또는 '역사신학'이 끼어들 필요나 여지가 아예 없다.
'역사 속 우연'에 대한 이 같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시각을 보며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러티브로서의 역사(History of Narrative)'와 만나게 된다. 역사는 무수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시공간이다.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사건들의 취사선택(取捨選擇)이 불가피하다. 역사가들은 자신만의 '역사관(歷史觀)'을 갖고 무수한 역사적 사건들 중 일부를 꺼내 자신이 갖고 있는 '사관의 성(城)'을 지을 '벽돌'로 삼는 것이다. 실증사학자들이 '실증될 수 있는 사건'을 무기로 이 같은 논의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현대 역사학은 그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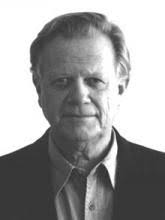
■ 화이트, "역사는 허구요 문학"
역사가는 '역사'라는 '건축물'을 쌓는 사람이다. 많은 이들은 '사건'이나 '사실(事實ㆍ史實)' 등 '벽돌'이 중요하다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역사라는 '건축물'을 쌓는 데에는 '벽돌'이 아닌 '관점(觀點)'이나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벽돌'보다 '건축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로써 역사는 '문학'이 되고 '장르'가 되고 '허구'가 된다. "역사는 과거 사실의 재구성"이라는 랑케(Ranke)의 실증주의 사관은 물론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카(Carr)의 해석 중심의 역사관을 훌쩍 뛰어넘는 역사 인식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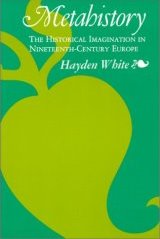
이쯤에서 우리는 한 역사학자 이름을 떠올리게 된다. '메타역사(Metahistory)'로 1970년대 역사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헤이든 화이트(Heyden White)다. 그는 아예 대놓고 역사의 객관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 "역사는 사실(史實)이 아닌 허구"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허구'라면 문학작품을 떠올린다. 그렇다. 그는 역사를 '문학'으로 본다. 그래서 역사학 분석에 내러티브나 스토리, 플롯, 장르, 수사법 등 문학비평의 개념을 가져온다. 또한 그는 '역사적 사건(Historica Event)'과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를 구분한다. '사건'은 객관적이고 역사학자에게 주어진 것인 반면 '사실'은 역사학자의 상상력이 발휘된 '진술(statement)'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건 자체는 일관된 스토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의 글에는 필연적으로 상상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계속>
--------------------------------------------------------------------------------

이재광 이코노텔링 대기자❙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사회학(고려대)박사ㆍ행정학(경희대)박사❙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욕주립대 초빙연구위원, 젊은영화비평집단 고문, 중앙일보 기자 역임❙단편소설 '나카마'로 제36회(2013년) 한국소설가협회 신인문학상 수상❙저서 『영화로 쓰는 세계경제사』, 『영화로 쓰는 20세기 세계경제사』, 『식민과 제국의 길』, 『과잉생산,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 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