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은 인륜대사 혼인식 음식에 들어가고 특히 폐백때 신부에 던져줘
밤나무 신성성에 대한 믿음은 신라 고승 원효대사의 탄생담에 담겨

#산과 들에 가을색이 그득하다. 지구 온난화니, 뭐니 해도 상강(霜降)이 지나면서 세상의 때깔이 짙어 지고 왠지 묵직한 느낌인 것을 보면 옛 사람들이 마주하던 계절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은듯 싶다. 울긋불긋하던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도 곧 막을 내리고 진한 갈색으로 침잠한 뒤 이내 흰 겨울로 들어갈 테다.
시인 박인환이 숙녀를 태워 보낸 목마가 주인을 버리고 가을 속으로 가버렸듯이. 인생도 계절의 수레바퀴를 닮았다는 걸 알았으니 내 삶도 어느덧 갈색이려니, 언제부턴가 이 계절이 쓸쓸하고 서러운 까닭이라.
가을이 풍요로운 건 소싯적 추억일 뿐 채곡채곡 쌓이는 낙엽 따라 공허해지는 그곳엔 반백년 도회생활에 잿빛 앙금만 천만 냥일세, 어흐~!
하늘에 흰구름은 천년동안 그대로 떠도는데(白雲千載空悠悠) /슬프구나, 내 인생은 눈 깜빡할 순간이니. 일모향관하처시 (日暮鄉關何處是 :날은 저무는데 내 돌아갈 고향은 어디 메뇨)/연파강상사인수(煙波江上使人愁: 강 위의 물안개 날 시름케 하는구나)!
#나는 가을 빛깔 중에서도 가운데쯤 되는 밤색을 좋아한다. 거무스름한 주황빛이 나는 색깔인 일반적인 갈색보다 어두운 붉은 색을 띤, 그야말로 잘 익은 알밤 껍질의 색깔 말이다. 그건 나에게 고향의 내음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마법이기도 하다. 나한테 알밤은 '고향'이란 말의 동의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는 산뿐만 아니라 행길 옆, 개울가는 물론 봇도랑 둑과 심지어 우물가에도 밤나무가 도열하고 있을 정도로 '밤나무골'이었다. 그러니 학교를 오가다, 또는 놀다가 출출해질라치면 아무 데나 밤나무 밑으로 가 어슬렁거리게 마련이었고, 금세 다람쥐 볼때기마냥 주머니마다 터질듯 배불뚝이가 돼 나오곤 하는 게 가을날 흔한 풍경이었다. 꼬맹이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죄다 밤 까기 선수여서 마치 청설모처럼 앞니로 단단한 껍질을 순식간에 벗기고는 이어 "퉤"소리 몇 번이면 떫은 보늬까지 말끔히 없애고 우그적 우그적 맛있게도 먹던 동무들 모습이 삼삼하다. 학교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화단과 교실바닥에도 밤 껍질 투생이여서 HR시간이면 "밤 껍질을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결의가 단골로 등장하곤 했었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집은 밤 부자(富者)였다. 해마다 가을이면 알밤으로만 가마니로 그득그득 십여 가마씩 거둬들였다. 요즘은 밤 하면 충남 공주를 치지만 당시엔 우리 계가 으뜸으로 꼽혔다. 국민학교 사회책에도 밤 주산지로 양주(楊州)고을이 실렸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알이 굵으면서도 맛이 좋기로는 광릉산 자락인 우리 동네가 최고였다. 한강정맥의 한 가지가 갈라져 서남쪽으로 삼태기처럼 옴팍하게 자리 잡은 곳으로, 거기에서도 우리 산은 동남향의 오른 쪽 날개여서 볕이 잘 들고 땅도 모래가 적당히 섞인 황토라 밤농사에는 그만이었다. 그래서인지 누가 우정 심은 것도 아니건만 백 살도 좋이 넘었을 법한 아름드리 밤나무들이 울울창창(鬱鬱蒼蒼) 온산을 덮고 있었다. 밤꽃 내음이 유난한 해엔 그루마다 알밤으로 두어 가마씩 거두는 게 일도 아닐 정도로 큰 나무들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을이면 벼 수확 다음으로 밤을 따 들이는 게 큰일이었다.
#정말로 밤 수확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요즘의 개량종들은 소독이나 거두기 등 작업하기에 편하도록 아담한 크기로 왜화(矮化)처리된 것들이지만 토종 밤나무들은 10여m씩 자라는 통에 밤을 따려면 아주 긴 장대가 필요했다. 쓸 만한 장대에 맞춤하려면 예전엔 길게 자란 대나무 밖에 없었는데 겨울이 되우 추웠던 우리 동네에선 자라지 못하는 까닭에 멀리 전라도에서 구해 와야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양주 일대가 밤의 산지인지라 장대 수요도 많아 가을철만 되면 의정부에 오일장에 덧붙여 대나무 장대 시장이 들어서곤 해 남행열차를 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편한 만큼 웃돈도 만만치 않아 열댓 자짜리를 열 자루 이상 마련하는데 꽤나 돈을 들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장대 시장이 우리 집에서 삼십 리 떨어진 탓에 우마차 신세까지 져야 해서 곰비임비 돈이 들었다. 장대만 있으면 뭐 하나? 장대를 부릴 줄 아는 꾼이 있어야지. 상상가지에 달린 밤까지 따기 위해서는 대나무 장대를 흔들어 손으로 잡은 밑동에서 낭창낭창한 가느다란 맨 끝까지 파동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장대의 끄트머리가 순간적으로 밤송이자루를 후려쳐 가지에서 떨궈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장대를 후릴 때마다 엄청 힘도 들뿐만 아니라 숙달된 요령도 필요한 까닭이다. 더구나 장대 길이로는 닿지 않는 밤송이를 털려면 아름드리나무에 한두 길쯤 올라가 나뭇가지를 밟고 줄기에 기댄 채 신공을 펼쳐야 했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선 밤 철이면 뽑혀 다니는 고수가 고작 서넛뿐이었다. 고수 아래 질까지 쳐도 일고여덟, 더 넉넉히 쳐준다 해도 열손가락을 꼽기가 벅찰 정도였으니까. 거기에다 집집마다 벼는 물론 다른 곡식이며 고추 등의 가을걷이거리가 줄줄이 늘어선 판이라 선수를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다. 밤을 다 거둬들이려면 적어도 한꺼번에 여남은 필요한데 늘 턱도 없어 엄니는 늘 끌탕하셨다. 밤도 한 철이라 아람이 벌기 전에 밤송이 째 따와야 헤실(虛失)이 적지, 그렇지 못해 때를 놓쳐 아람이 벌기 시작하고 비바람까지 불어대는 날엔 밤톨이 죄다 쏟아져 풀수쾅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밤농사를 망치기 십상이었다.
#밤 따는 날은 아침부터 바빴다. 미처 날이 밝기도 전에 줄잡아 대여섯 명의 일꾼들이 커다란 바소쿠리를 장착한 지게를 지고 모여들면 널찍한 사랑방엔 잔칫날을 방불케 하는 아침이 차려진다. 워낙 힘든 일이라 갈치나 고등어, 혹은 아지 같은 비웃도 넉넉하게 굽고, 조리고, 막 화덕을 떠난 돼지고기 찌개도 바글바글 끓는 등 이것저것 평소엔 보지 못하던 반찬들이 즐비하다. 일꾼들이 아침밥으로 뱃심을 돋우는 사이 안채에선 식구들도 서둘러 아침을 때우곤 저마다 허리에 대리키를 찬 채 집게와 삼태기를 들고 밤 갓을 향해 집을 나선다. 일꾼들이 나무에 올라가 밤송이를 털면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워 모으기 위해서다. 잘못 하면 따가운 밤송이의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껏 일꾼의 작업 방향을 피해 밤송이를 모아야 한다. 또 한편으론 풀수쾅을 헤쳐 가며 밤송이를 뛰쳐나온 알밤들을 챙겨야 하는데 재수가 없으면 땅벌 집을 건드려 그야말로 눈탱이가 밤탱이로 되기도 하고, 혹은 한창 독이 오른 뱀한테 발목을 물리는 사고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니 이래저래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다.
#온 식구가 매달려 떨어진 밤송이를 주워 모으는 까닭에 지게마다 금세 소쿠리가 그득 그득 채워졌고, 일꾼들 가운데 두셋은 연신 집으로 져 날랐다. 왼 종일 나무를 오르내리며 장대질하랴, 지게질하랴 천하의 항우장사라도 해질 무렵이면 곤죽이 되게 마련이지만 바깥마당도 모자라 마당 밑 논바닥에까지 왕의 무덤마냥 산을 이룬 밤송이더미들이 훈장처럼 고됐던 하루를 증거하면 일꾼들도 제 것인 양 씨익 눈웃음을 흘리곤 했다. 밤의 풍흉(豐凶)에 달리기도 하지만 일꾼 모으기 사정에 따라 밤 따기에만 며칠씩 걸리기도 했다. 밤 더미에는 풀을 베어다 고루 두툼하게 덮어주고 그 위에 물을 뿌려주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덮어준 풀이 썩으면서 밤송이도 함께 물크러져 조금만 힘을 가해도 밤톨이 쉽게 삐져나오게끔 하는 지혜다.
#밤나무에서 밤송이를 털어오는 게 밤농사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밤송이에서 밤톨을 끄집어내는 밤 까기 작업이다. 알밤이라야 비로소 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밤 까기는 다른 가을걷이를 모두 마친 뒤 이른바 한겨울 농한기에 주로 한다. 풀이 썩는 기운에 덩달아 반쯤 썩은 밤송이를 발로 뭉개거나 호미나 낫으로 툭 쳐서 밤알을 빼내 둥구미나 함지박, 다라, 도레방석 등에 담는 단순작업이라 조무래기들이 거들기도 하지만 예전 겨울은 워낙 추웠던 탓에 밤 까기는 거의 안식구들 몫이었다. 할머니와 엄니는 물론 서울 큰 엄니, 덕소 고모, 포천 나무골 대고모님까지 합세하셨고, 동네에서도 친척인 해용이 할머니, 됫박할머니, 그리고 우리 집 궂은일을 도맡다시피 하는 해환 엄니 등이 총출동해 밤 까기에 매달렸다. 멀리서 오신 친척들은 아예 스무여 날을 사랑방에 묵으시면서 일하셨고 동네 분들도 아침 일찍 출근하듯 오셔는 저녁 진지를 잡숫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들 가셨다.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작업을 한다고는 해도 어차피 한데라 엄동 추위를 견디며 일하기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서넛씩 얼러서 화로 하나를 옆에 두고 손이 곱을 때마다 불기를 쬐지만 돌아서면 금방 손이 시렸다. 하지만 워낙 이골이 난 분들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밤 까기를 계속하셨다.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면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뭐라 뭐라 우스갯소리까지 나누며 일하시는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엔 '어른들이 되면 추위를 모르나 보다'고 여기기도 했을 정도다. 이렇게 어렵사리 작업 끝에 얻은 알밤은 가장 굵은 왕밤, 가운데 굵기의 중치, 그리고 잔챙이와 벌레먹이 파치로 구분해 가마니에 옮겨 담아 보관했다. 밤 가마니는 헛간을 채우고도 남아 봉당의 여분댕이는 물론 처마 밑을 빙 둘러가며 공간이란 공간은 죄다 차지했다. 할머니께선 상품성이 없는 잔챙이와 파치 밤을 커다란 가마솥에 삶게 해 이웃들에게 몇 바가지씩 퍼주시곤 했다. 이 바람에 한 겨울철이라도 우리 집엔 밤 까는 어른들과 밤을 얻으려는 아이들이 늘 부닐었다.
#밤나무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밤나무라 이름만으론 '무엔가 어쩔 수없는 운명을 지닌 가련함'이 연상되지만 나무치고는 실상은 엄청 대접을 받는 존재였다. 밤톨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 크게 자라도 껍데기는 계속 떨어지지 않은 채 붙어 있는데 이를 두고 우리 조상들은 '근본을 져버리지 않는 덕성(德性)'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원보본(追遠報本)을 위해 모시는 위패(位牌)는 반드시 밤나무로 만들고, 제사상에는 생률(生栗)을 빠뜨리지 않는다. 게다가 제사상 차림조차 '조율이시(棗栗梨柿)'이거나 '홍동백서(紅東白西)', '조동율서(棗東栗西)'이거나 밤이 대추와 함께 진설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밤은 인륜대사인 혼인식 음식에도 꼭 들어가고 특히 폐백 때 신부한테 '빨리 아들을 낳으라!'는 뜻을 담아 대추와 함께 던져주는 것이 바로 밤이다. 대추(棗子)와 밤(栗子)을 합쳐 한자로는 '棗栗子'인데 이는 중국발음으로 '早立子'와 같이 "자오리즈"로 읽는 점에 착안한 풍속이다. 또 밤을 뜻하는 '栗'자가 조를 뜻하는 '粟(속)'자와 모양이 비슷한 점에서 차용한 다음, 다시 발음이 같은 '速(빠를 속)'자로 치환해 '早速子(자오쉬즈: 아들을 빨리 낳아라!)'로 풀이하기도 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밤나무는 죽어서 신주(神主)가 됨으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신성한 나무이기에 조상들은 밤나무를 심는 것은 덕을 쌓는 것이라고 여겼다. 율곡 이이선생은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며, 사후에 송시열이 율곡 선생 생전에 살던 곳이 밤나무가 많은 곳이므로 호(號)를 율곡이라 지었다. 그런데 그 밤나무들은 율곡의 아버지가 아들의 호환(虎患)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전설이 있다. 하지만 이 전설 역시 밤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에서 유래된 것일 테다.
밤나무의 신성성에 대한 믿음은 신라 때 고승 원효(元曉)대사의 탄생담(誕生談)에도 담겨 있다. 원효는 현재 경산시 압량 밤골에서 태어났는데 만삭의 모친이 골짜기에 있는 밤나무 밑을 지나다 산통을 느껴 남편이 옷을 벗어 나무에 걸쳐 가린 뒤 그 아래서 낳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밤나무를 사라수(娑羅樹)라 했다고 한다. 원효가 출가한 뒤 원래 이 골짜기의 서남쪽에 있었던 부모의 집을 절로 삼아 초개사(初開寺)라 불렀고, 그 밤나무 아래에도 절을 짓고 사라사(沙羅寺)라 이름 붙였다.
한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따르면 밤나무를 가로수로 심기도 했는데 이를 행율(行栗)이라 했다. 여기서 행(行)은 잘 정리된 거리를 뜻한다. 『본초강목』에는 '다리가 약한 사람이 밤을 몇 되 먹으면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돼 있다. '栗'자는 갑골문에도 나오는데 나무 위에 밤송이가 많이 달린 모습을 나타낸다. 밤송이는 한자로 '栗房(율방)', 밤 가시는 '栗刺(율자)'이다.
#늦가을 서늘한 바람 소리에 어린 시절 잘 익은 아람이 떨어지는 고향을 본다.
'한 줄기 가을빛이 나무 끝에 비추니(一抹秋光到樹頭)/ 맑은 황색 옅은 녹색 암암리에 떠오르네(淡黃輕綠暗相浮)/ 밤송이에 바람 불어 아람이 떨어지고(風吹金蝟迸虯卵)/ 아이들은 짝지어 좋은 놀이 하는구나(閒伴兒童作勝遊)'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의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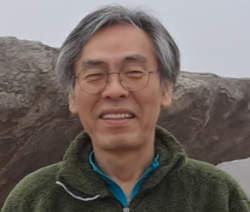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항공사에 다니다 1982년 중앙일보에 신문기자로 입사했다. 주로 사회부,문화부에서 일했다. 법조기자로 5공 초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철희ㆍ장영자 사건을 비롯,■영동개발진흥사건■명성사건■정래혁 부정축재사건 등 대형사건을, 사건기자로 ■대도 조세형 사건■'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유명한 탄주범 지강현사건■중공민항기사건 등을, 문화부에서는 주요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들을 시리즈로 소개했고 중앙청철거기사와 팔만대장경기사가 영어,불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 30개 언어로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엔 초짜기자임에도 중앙일보의 간판 기획 '성씨의 고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1990년대 초에는 국내 최초로 '토종을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종자전쟁에 대비를 촉구하는 기사를 1년간 연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토종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밖에 대한상의를 비롯 다수의 기업의 초청으로 글쓰기 강의를 했으며 2014인천아시안게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