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까지 문학에 심취했던 자취가 한강의 노벨상 자양분 됐다면 억측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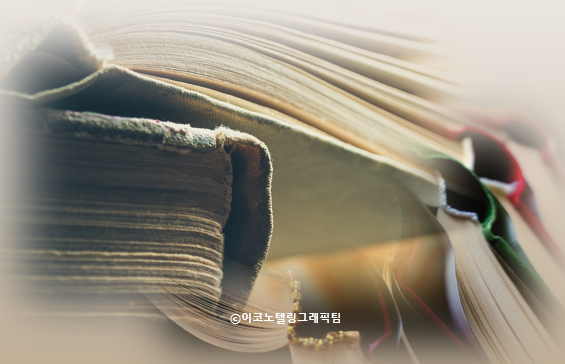
1931년 1월 26일 자 동아일보에 경성지역 여자 고보생 독서 경향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3개 여고보의 최상급반 44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주일새 읽은 책의 저자, 읽게 된 동기, 읽은 소감"을 설문조사해 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교과서용 참고도서는 제외한 단서가 붙은 이 조사의 결과는, 익히 짐작이 가듯이 조선 사람이 지은 조선책보다 일본 사람이나 기타 외국인 쓴 책이 다수로 나타났다.
조선 소설을 꼽은 학생은 단 3명이었는데, 2명이 『무정』, 1명이 『재생』을 읽었다고 했다. 모두 이광수의 작품인데 1918년 단행본으로 선보인 『무정』은 일제강점기 내내 스테디셀러였으니 그럴만했다.
전체적으로는 소설류로서는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이광수의 작품이 여럿 거론되었는데, 기자가 "현실적, 도회적, 사실적이며 에로틱하다"고 평한 일본 인기작가 기쿠치 칸의 작품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데 요즘 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당시 여학생들이 이미 페미니즘 서적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사에 응한 여학생들은 노라의 '가출'로 귀결되는 입센의 『인형의 집』, 20세기 초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의 기수로 불리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붉은 연애』를 독서목록에 넣었다. 특히 콜론타이의 책은 3권이나 꼽혔다. 여자 고보생들이라면 당대의 선각자층으로 꼽을 수 있긴 하지만 요즘에도 잘 읽히지 않는 이런 책들을 1930년대에 읽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하다. 이를 두고 기자는 "『인형의 집』에서 뛰쳐나온 발길이 콜론타이의 문학를 거치게 됨이 또한 자연스럽다"고 평했다.
이는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계기가 되어 들춰본 『근대의 책 읽기』(천정환 지음, 푸른역사)에 실린 내용인데 이뿐 아니다. 1934년 대중 잡지 『삼천리』는 '문학기생'으로 유명했던 장연화의 글을 실었다.
평양기생학교 출신인 장연화는 이 글에서 평양여고보를 다니던 16세 때 담임선생에게서 톨스토이의 「갓쮸사」와 투르게네프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속에는 때 아닌 불길이 일어났다"고 했다. 특히 "투르께프의 작품에 반해 평양시내 서점을 돌아다니며 소설은 물론 산문시, 서한집까지 거지반 뒤져 읽었다"고 했다.
집이 가난해 여고보를 마치지 못하고 기생학교에 들어갔던 그녀는 거기서 조선문학에 눈 떴다고 했다. "투르게네프나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위대하기는 하지만 어쩐지 구두 신은 채 발끝을 긁는 듯이 실감이 나지 않아" 현진건, 김동인, 리광수, 염상섭, 김동환 등의 작품을 읽은 끝에 "문학은 역시 제 문학이라야 하겠다"고 했다.
『삼천리』가 장연화의 글을 실은 것은 조선문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어서 그런 점도 있겠다. 하지만 100년도 더 전에 여자 고보생은 물론 기생까지 문학에 심취했던 자취가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데 자양분이 되었다면 지나친 억지일까.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국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로 정년퇴직한 후 북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엔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초빙교수로 강단에 선 이후 2014년까지 7년 간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미디어 글쓰기를 강의했다. 네이버, 프레시안, 국민은행 인문학사이트, 아시아경제신문, 중앙일보 온라인판 등에 서평, 칼럼을 연재했다. '맛있는 책 읽기' '취재수첩보다 생생한 신문기사 쓰기' '1면으로 보는 근현대사:1884~1945' 등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