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장과 함께 경기 지켜 보던 이명박 사장에 특명이 떨어졌고 현대 농구부장이 총대
돈은 맘대로 쓰라고 해서 실탄 두둑했지만 이미 삼성이 찜해놓은 상태라 성사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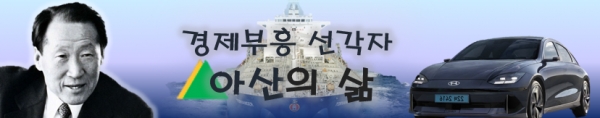
현대와 삼성은 농구단 창단 때부터 선수 쟁탈전이 심했다.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이충희 스카우트였다.
정주영 회장은 운동을 다 좋아했지만, 특히 농구 보는 것을 좋아했다. 장충체육관이나 잠실실내체육관에 직접 가서 관전하는 장면이 TV 중계에 자주 잡히기도 했다. 현대 농구단 경기는 어지간하면 보는 편이었다.
1978년 말, 대통령배 농구대회 결승에서 현대가 고려대와 맞붙었다. 정 회장은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과 함께 VIP석에서 관전했다.

현대가 여유 있게 우승할 거라는 전망이었지만, 고려대에는 2년생 '슛 도사'이충희가 있었다. 종료 4분 전까지도 현대가 10점 차로 앞섰으나 막판에 추격을 허용해 연장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종료 버저가 울리기 직전, 이충희가 자신의 주특기인 페이드 어웨이 슛으로 마지막 골을 넣었다. 97-101로 현대의 패배.
그때 정 회장이 옆에 앉아있던 이명박 사장에게 말했다.
"24번. 저 24번 데려와." (이충희의 등 번호가 24번이었다)
느닷없는 지시에 이 사장이 어리둥절하며 반문했다.
"제가요?"
그러자 정 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 사장 고려대 출신이지? 당신이 농구팀 맡고, 24번 데려와."
현대 남자농구팀의 소속이 현대조선에서 현대건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졸지에 농구팀 총책임자가 된 이명박 사장은 이충희 스카우트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당장 유병하 농구부장이 호출됐다.
"자동차하고 기사 내줄 테니까 무조건 이충희 데려와. 돈은 필요한 대로 써."
이 사장은 활동비로 쓰라며 현금 봉투를 건네줬다. 1,000만 원 이었다. 당시 이 돈이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이 사장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다.
유 부장은 난감했다. 인천 송도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한 이충희는 일찌감치 슈터로서 재능을 발휘했다. 창단 당시 현대에 좋은 선수를 많이 뺏긴 삼성은 미리 이충희를 점찍고 입단에 공을 들였다. 더구나 이충희는 삼성 이인표 감독과 먼 친척 간으로 이 감독이 아저씨뻘이었다.
"그건 안 됩니다. 이충희는 삼성에서 이미 집도 사주고, 돈도 줬습니다. 부모는 물론 고대 박한 감독이나 고대 총장까지 다 삼성에 보내기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 사장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유 부장을 쏘아봤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사장 됐겠나? 왕 회장 정신으로 밀어붙이면 다 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얘기를 들려줬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있지? 거기가 한강 변 모래밭이었어. 그걸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게 가능했을 것 같아? 선수 하나 데려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무조건 데려와."
만 36세에 현대건설 사장에 오른 이명박 사장을 직원들은 '리틀 정주영'이라고 불렀다. 마치 정 회장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다. 그러니 유 부장은 절망에 빠진 상태로 뒤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계속>
---------------------------------------------------

■이코노텔링 이민우 편집고문■ 경기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대한일보와 합동 통신사를 거쳐 중앙일보 체육부장, 부국장을 역임했다. 1984년 LA 올림픽, 86 서울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90 베이징아시안게임, 92 바르셀로나올림픽, 96 애틀랜타올림픽 등을 취재했다. 체육기자 생활을 끝낸 뒤에도 삼성 스포츠단 상무와 명지대 체육부장 등 계속 체육계에서 일했다. 고려대 체육언론인회 회장과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