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우 소피마르소, 광고 촬영 위해 한국 들렀다가 재래식 뒷간에 기겁

# 한양이 똥 바다처럼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늘어난 인구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선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이 농업생산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먹거리 문제가 좋아졌기 때문인데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똥과 오줌 덕분이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4세기부터 철제 농기구와 우경(牛耕)이 보급돼 토지를 규칙적으로 이용하게 됐다. 하지만 '땅심'을 유지하기 위해선 2~3년에 한 번씩 경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여러 가지 땅심을 돋우는 방법이 개발돼 12세기 이후 연작법(連作法)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똥과 오줌을 거름*으로 이용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 거기에다 임진왜란 뒤엔 모내기 농법(移秧法)까지 확산되면서 토지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작이 널리 보급된 15세기 토지생산성은 이미 상당히 높아 인구밀도 또한 세계 수준을 상회했다. 1500년 경 ㎢당 인구는 중국 25명, 서유럽 8명이었던데 비해 조선은 40명이었을 것으로 학계는 추산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기인 15세기 초 10만여 명이던 한양의 인구는 18세기 들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785년 무렵 영국에서 인구 5만 명을 넘긴 도시가 런던 등 네 곳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인구였던 셈이다. 거름으로서 똥과 오줌에 대한 효용 가치**가 확인되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모으기 위한 시스템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 화장실, 즉 뒷간이다.
*로마 시대 박물학자 플리니우스(Plinius)가 쓴 《박물지(Naturalis historia)》에도 '사람의 똥이 최고의 비료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분뇨에는 질소(N), 인(P), 칼륨(K) 같은 비료 성분이 풍부하다. 특히 인(P)은 지구적으로 매장량이 제한된 중요한 자원으로, 미래 식량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수세식 화장실에서는 이 자원이 모두 물과 함께 흘러가 버린다. 우리는 소중한 자원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셈이다.
#화장실의 순 우리말은 '뒷간'이다. 이 '뒷간'이 처음 나오는 문헌은 1458년에 간행된 《월인석보(月印釋譜)》다. '뒷간에 핀 꽃 같아서'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 뒤 1489년에 나온 의서《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에도 '밤에 혹시 뒷간에 가거나'라는 구절이 나와서 뒷간이라는 말이 꾸준히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뒷간은 '우리 몸의 뒷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곳'이란 뜻으로 우리 동네에선 '둑간'이라 했다. 직설적으로는 '똥둑간'이다. 대개 집에서 북쪽 으슥한 곳에 자리 잡아 '북수간(北水間'이라고도 했다. 이밖에 서각(西閣), 정방(淨房), 청측(靑厠), 청방(靑房), 청혼(靑渾), 측간(厠間), 측실(厠室), 측청(厠靑), 측혼(厠渾), 혼헌(渾軒), 회치장(灰治粧) 등등으로 불렸다. 특히 궁궐 나인들은 '측간' 말고도 '급한 데', '부정한 데', '작은 집'이라 했다. 그러다 일제 때 직설적 표현 대신 '변소'라고 하다 나중엔 영어 'toilet'를 직역한 '화장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삼국시대부터 거주 인원이 많은 사찰이나 왕궁 등 극히 일부에서 뒷간을 설치해 사용했지만 귀족 등 권력층은 똥이나 오줌을 모두 요강으로 해결했고 일반 백성들도 요강, 아니면 그냥 밖에서 볼일을 보곤 했다. 뒷간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12세기 고려 때부터 똥오줌을 거름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중국에서 일찍이 6세기 농업기술서인 《제민요술(齊民要術)》에 똥·오줌을 거름으로 이용하는 답분법(踏糞法)이 등장하고, 특히 송(宋)대에 똥·오줌은 땅을 살리는 약(糞藥)으로 인식돼 황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면서 고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원나라 관리이자 농학자 왕정(王禎·1271~1333)이 펴낸《왕정농서(王禎農書)》(1313)에 사람과 가축의 분뇨를 보관하는 분옥(糞屋)을 설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수확량이 급증하자 우리나라에도 농사에 분뇨 이용법이 전파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계속돼 우리나라의 현존 최고의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1429)에 사람의 똥과 그것을 재(灰)에 섞은 똥재(糞灰)가 대표적 거름으로 소개됐다. 17세기 이후 사람과 가축의 똥이 재와 배합되고 두엄의 부숙(腐熟)이 널리 행해지면서 똥과 오줌의 가치가 높아져《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선 뒷간에 항아리를 설치해 똥·오줌을 수거하고 똥재를 만드는 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17세기《위빈명농기(渭濱明穠記)》에서는 나무와 풀을 태운 재를 잿간에 쌓아두고 날마다 오줌을 뿌려 비료(尿灰)를 만든다 했고, 18세기《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선 구덩이 속에 똥을 저장하는 방법(窖糞法 )과 말린 똥을 풀과 함께 태워서 저장(煨糞法)하는 똥둑간(糞屋)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다.
가축과 사람의 똥오줌을 일찍이 작물의 거름으로 이용한 것이 동아시아 농업의 특징인데 조선에선 여기에 재를 섞어 효용성을 더욱 높였다. 집이 온돌을 사용하는 구조여서 매일 아침 아궁이에서 나오는 재를 수거해 저장하고 분뇨를 끼얹었다. 그 결과 재가 바람에 날리지 않고 똥의 냄새까지 없애면서 오줌재와 똥재가 만들어져 훌륭한 거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경기도 화성의 유생 학자 우하영(禹夏永·1741~1812)이 쓴 농업정책서《천일록(千一錄)》에 따르면 1년 간 집안사람들의 오줌을 모아두면 백무(百畝)의 밭에 충분히 거름을 줄 수 있다고 했고, 1888년에 나온 지석영(池錫永)의 보리재배 전문서인 《중맥설(重麥設)》에서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길가에 공중변소를 설치해 분뇨를 수거할 것을 권고했다.
#한양에서 똥과 오줌으로 넌더리를 치며 난리뻐꾹일 때 농촌에선 거름으로 모시려 댕댕거렸다. 애어른 할 것 없이 외출했다가도 똥은 반드시 집에 와서 누어야 하고, 벌판에 뒹구는 개똥도 보는 족족 주워 집으로 가져오는 게 일상이었다. 오죽하면 구구절절 뭔 토막 같은 말씀만 적어놓은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똥을 금처럼 아끼고(成家之兒 惜糞如金), 집안을 망칠 아이는 돈을 똥처럼 쓴다(敗家之兒 用金如糞)'는 내용이 들어갔을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1970년대만 해도 시골에선 뒷간이 단순히 볼일 보는 데가 아니라 농사의 풍흉(豐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거름 공장'이었다. 서울 근교인 우리 동네도 그랬고, 우리 집도 물론 그랬다.
#우리 집엔 둑간이 두 곳 있었다. 하나는 안식구들과 아이들을 위해 집안에 두고, 다른 하나는 사랑방용으로 남정네들을 위해 울 밖에 있었다. '뒷간과 사돈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듯이 두 곳의 둑간은 모두 살림공간과는 거리를 두고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둑간을 안팎으로 따로 마련하는 걸 두고 '똥둑간도 내외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사실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울안에 있는 둑간은 안에 있다고 해서 '안둑간'이기도 하지만 여인들이 사용하는 곳이라 '암둑간'이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음기(陰氣)가 센 곳이었다. 특히 안둑간은 아궁이에서 불 때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곳이기도 해서 자칫 잘못하면 불씨가 살아나 화재를 당할 우려가 늘 있는 터라 이 화기(火氣)를 음기가 눌러줄 것이라 믿었다. 어릴 적 우리 집엔 아궁이가 다섯 개나 있어서 매일 나오는 재의 양이 만만치 않았다. 주방을 겸한 안방 부엌에는 부뚜막 가운데에 중간 크기의 밥솥이 있고 그 왼쪽에 작은 국솥, 오른쪽엔 두부나 메주를 만들 때 쓰는 커다란 닷 말들이 가마솥이 걸려 있었다. 또 할머니가 기거하시는 사랑방 부엌엔 쇠죽을 쑤는 커다란 가마솥(일곱 말들이)이, 대청마루 왼쪽에 붙은 건넌방 부뚜막에도 닷 말들이 무쇠솥이 늘 끓었다. 이 산 저 산 다 잡아 먹고도 모자라 입을 벌리는 게 아궁이라지 않던가. 한 여름을 제외하곤 매일 다섯 가마솥을 끓게 하려면 아궁이마다 엄청난 땔감이 들었고, 그 찌꺼기인 재 또한 많을 수밖에 없었다. 사시장철 나무로 된 장작을 때면 화력도 좋고 불 때기가 편하련만 당시엔 산에 땔감용 나무가 거의 바닥이 나 가고 있던 터라 엄니는 큰 일 때 쓸 요량으로 장작을 아끼시느라 가랑잎을 태워 부엌일을 하시곤 했다.** 가랑잎을 태워 가마솥을 데우려면 거의 쉴 새 없이 부지깽이를 놀려 가랑잎을 아궁이 속으로 밀어 넣어야 했는데 조금만 누져도 잘 타지 않고 연기를 쏟아내기 일쑤여서 가뜩이나 호랑이 같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시집살이로 죽을 맛이던 엄니는 이래저래 눈물이 마를 짬이 없었다. 더구나 가랑잎은 장작에 비해 재도 많이 남겨 재를 치우는 것도 큰일이었다. 솥이 큰 아궁이일수록 재도 많을 수밖에 없어 큰 아궁이에선 삼태기로 한 가득씩 나왔다. 부엌용 거물개***를 아궁이 깊숙이 부넘기 밑까지 집어넣어 살살 긁어낸 뒤 부삽으로 재삼태기에 그러담아 안둑간까지 날라야 하는데 조금만이라도 넋을 딴 데다 쏟을라치면 재가 바람에 날려 온 집안이 재 가루를 뒤집어쓰기 때문에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안둑간은 안방부엌 문을 열고 나가면 뒤뜰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혹여 밖에 바람기가 있는지 살피고, 그렇지 않더라도 별안간 불 때를 대비해 가슴팍으로 에워싸듯이 안고 나르는 게 기본이었다. 안둑간은 아름드리 감나무가 있는 채마밭 끄트머리에 어른 키보다 높게 흙담으로 두른 다음 위로 두어 자쯤 떼어 초가지붕을 올린 구조였다. 한 칸 넓이로, 바닥 중간에 엉덩이를 까고 올라 앉아 일을 볼 수 있도록 부춛돌을 놓았는데 뒤에는 아궁이에서 갓 나온 새 재를 쌓아두고 일을 마치면 넉가래로 재를 그러다 똥을 덮은 다음 앞으로 던져 쌓아둔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일을 본 다음 야들야들한 화장지로 뒤를 닦아 마무리하지만 그 땐 그런 게 없어 늘 똥꼬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둑간에 가서 엉덩이를 까고 앉으면서 동시에 하는 일이 벽춤에 달아둔 볏짚을 한 움큼 뽑는 것이었다. 이놈은 타작한 뒤 그대로가 아니라 나름 거친 껍데기 검불을 떼어내고 추린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여서 거칠기 짝이 없었다. 하여, 아랫배에 안간힘을 쏟으면서 손으로는 지푸라기를 부벼대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함께 해야 했다. 특히 살을 에는 동장군이 기세등등한 한겨울 밤에 똥을 누러 가면 엉덩이가 떨어져나갈 판에 집과 붙어 있는 뒷동산에선 집채만 한 부엉이는 무섭게 울어대지, 똥은 빨랑 안 나오지… 죽을 맛인데, 곱은 손으로 부비는 시늉만 한 지푸락지가 오죽했겠는가. 적어도 삼세번은 지푸락지를 돌려가며 밑을 닦아야 하는 법이거늘 한 번 스을쩍 스치는 듯 했는데도 똥꼬가 베어나가는 아픔이 저르르 하니 에라 모르겠다, 지푸락지 밑씻개를 앞 잿더미에 던지고 둑간 귀신한테라도 쫓기듯이 방으로 줄행랑을 치니 그 밑은 또 오죽 했으리오!
이나저나 애어른 할 것 없이 매양 이런 식이니 겨울이 채 가기도 전에 똥잿더미는 산처럼 쌓여 한 칸이 조이 되는 잿둑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그러면 이 잿더미를 덜어내 울밖에 있는 바깥마당의 귀퉁이에다 쌓아 두곤 했다. 이미 '쌩재(新灰)'가 아니라 바람이 불더라도 그닥 날리지는 않지만 만사불여튼튼이라 더미에 오줌을 끼얹은 다음 삽으로 거죽을 두드려 다지면 마치 검은 공구리를 친 것처럼 맨질맨질 윤이 나기까지 할 정도여서 해토머리까지 끄떡없었다.
*인도 힌두 경전에는 '화살을 쏘아 그 화살이 떨어진 곳보다 더 먼 곳에 똥을 누어라'는 구절이 있디고 한다. 또 다른 힌두 경전 '비슈누 푸라나'에는 '똥은 물로부터 45m, 소변은 사람 사는 곳으로부터 4.5m 떨어진 곳에 누라'는 내용이 있다. 성경 '사해문서'에도 '진영(陣營)에서 북쪽으로 1000~3000큐빗(cubit), 즉 약 450~1350m 떨어진 곳에 똥을 누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름엔 보릿짚, 밀짚도 때고, 가을엔 조대, 옥수수와 수수깡, 참깨와 들깨 대, 목화대 등 수확하고 난 식물 줄기와 잎도 말려 닥치는 대로 땔감으로 썼지만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했다.
***우리 계에선 '고무래'를 이렇게 불렀다. 낟알을 펴고 모을 때 쓰는 것보다 자루도 훨씬 짧고 머리판때기도 작아 상대적으로 앙증맞았다.
#한편 바깥에 있던 둑간은 재를 쓰는 안둑간과는 달리 그야말로 순수한 '똥둑간'이었다. 실제로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구분해 불렀다. 이 똥둑간은 구조가 간단했다. 스무 말도 더 들어갈 것 같이 아주 커다란 노깡을 묻고 그 위에 쪼그리고 앉아 큰일을 볼 수 있게끔 나무판대기(널판지)로 부출을 놓은 형태다. 물론 사방 벽을 널빤지인지 죽데기인지 어중간 한 놈들로 둘러쳐 밖에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헛간처럼 맞배 초가지붕을 올려 눈비를 가리면서도 사방팔방 바람이 통해 냄새가 빠지게 했다. 이 똥둑간은 타원형으로 생긴 바깥마당의 북쪽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대부분 사랑방을 쓰는 남정네들의 해우소(解憂所)였다. 사랑채는 기역자인 안채로 들어가는 대문 옆 왼쪽에 일자로 붙여 지어 전체로는 미음자 모양의 집에서 서쪽 변을 담당한 형태였는데 뒤쪽에도 커다란 여닫이 방문이 나 있어서 대문을 거치지 않고도 언제나 방을 들락날락 할 수 있었다. 사랑방은 안방처럼 한 칸 반 크기로 윗목의 반 칸은 장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저녁마다 동네 남자들이 찾아와 아랫목을 차지하고 놀다가곤 했다. 사랑방은 할머니께서 주인(?)이셨는데 집성촌인 동네를 통틀어서도 항렬이든 연세로든 상(上)어른이라 남정네들이 내외 않고 스스럼없이 드나들어 말 방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서도 웬만하면 건넌방에서 누워계시다가 말꾼들이 파해 집으로 가면 그제서안 주무시러 가는 등 배려를 하셨다. 우리 사랑방이 동네 남자들의 말 방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우선 아버지께서 면사무소에 다니시는 까닭에 소소한 행정민원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다 이따금씩 '나지오(radio)'를
듣는 재미도 있었으니까. (*나지오는 사방동네 모두 해서 두 대 뿐이었다.) 여기에다 우리 사랑방에 오면 늘 담배를 공짜로 피울 수 있었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다. 비록 권련이 아니고 봉초담배였지만 워낙 못 살던 시절이라 웬만한 집에선 담배 값이 무서워 벌벌 떠는 마당에 공짜담배라니. 그 시절엔 아무리 째지게 살아도 누구라도 찾아오면 하다못해 냉수라도 한 사발 대접하는 게 인심이었는데 매일 찾아오는 동네사람이라고 몰라라 할 수 없어 처음엔 국수도 말아내고 밤이나 홍시도 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이라 나중엔 어쩔 수없이 담배를 내놓게 됐다. 내가 국민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집에서 담배를 팔아 우리 집 옥호가 '담배 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엔 집집이 시계도 없어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저녁을 먹고, 이어 한숨도 돌리기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시골 풍경이었다. 하지만 농사일도 끝나고 기나긴 겨울밤에 허구헌 날 잠만 퍼 잘 수도 없다보니 우리 사랑방이야말로 꿀이 나오는 '천당(天堂)'일 수밖에. 사랑방은 저녁을 먹기 전에 늘 이들 손님(?)을 맞을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소를 칠 때는 쇠죽을 쑤고, 마구간이 비어 있을 때는 군불을 지펴서라도 방바닥은 쩔쩔 끓어 앞개울이 꽝꽝 얼고 간장독이 터지는 혹한에도 말꾼들이 앉자마자 몸을 녹일 수 있게 했다. 게다가 화로엔 아궁이에서 막 옮겨 담아 온 잉걸불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하마 있을 위풍의 흔적조차 쫓아버리니 방안은 그저 훈훈하다 못해 어떤 때는 웃통을 벗어야 할 지경일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렇게 초저녁을 뎁혀 놔야 말꾼들이 돌아갈 때까지 서너 시간을 식지 않은 채 보낼 수 있었다. 사랑방에는 줄창대고 출근하는 고정인사가 네댓에다 종종 먼 동네에서 우정 찾아오는 이들까지 합쳐 대충 예닐곱은 늘 부닐었다. 그 시절엔 이렇게 머릿수가 차면 으레 노름판이 벌어지게 마련이지만 우리 사랑에선 할머니께서 '방장(房長)'인 까닭에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 화로와 등잔불이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그 옆에 봉초 담배 한 봉과 빛바랜 책이 한 권, 그리고 말꾼들이 연장 순으로 아랫목부터 빙 둘러 벽에 기댄 채 얘기를 나누는 게 고작이었다. 말꾼들은 처음 얼마간은 얘기만 주고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이가 연장자한테 "한 대 뻥 하시죠."하며 담배를 권하면 연장자는 당연하다는 듯 책을 한 장 찢어낸 뒤 귀퉁이를 뜯은 봉초에서 담뱃가루를 한 꼬집 덜어 올리고는 돌돌 만 다음 입으로 가져가 침을 쓰윽 발라 붙이는 것으로 즉석 권련을 만든다. 그리고는 화롯불에 불을 붙인 뒤 빨아대기 시작한다. 이어 다음 연장자가 불을 붙이고 또 그 다음 순으로 줄줄이 담배 공연(共煙)을 해댄다. 하지만 한꺼번에 피는 건 두세 명이 어서 한 차례를 마치려면 30~40분은 소요됐다. 대개 한 사람이 서너 차례 가량 피고나면 한 열 시나 되고, 그러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일어나 집으로 가는 게 우리 동네 남정네들의 루틴이자 우리 사랑방의 매일 반복되는 겨울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 단골 중에 매일 서너 명씩은 바깥 둑간엘 들러 볼일을 보고 가곤 했다. 거기에도 뒤처리용으로 늘 책이 한 권 있었다. 당시에 지푸라기 대신 종이로 뒤처리를 하는 곳은 우리 마을에서 우리 사랑방 둑간이 유일했다. 매일 같이 담배종이로, 화장지로 희생(?)된 그 책들은 우리 아버지의 학창시절이 배어 있는 교과서며 소설책 등이었다.
#조선인들은 현대 한국인에 비해 남성은 네 배, 여성은 두 배 반, 어린이는 한 배 반을 먹었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점심은 아침과 저녁에 비하면 양이 절반이지만 요즘에 비하면 그래도 외레 두 배나 된다. 내가 요즘 먹는 한 끼 밥은 150㎖정도지만 한창 자랄 때는 680㎖l크기의 밥그릇에 고봉으로도 모자라 늘 먹고 돌아서기 무섭게 속이 헛헛하고, 앉았다 일어서면 하늘이 노래지곤 했다. 먹는 게 밥에다 육(肉)것이라곤 언감생심(焉敢生心)이고 김치 몇 조각뿐이니 그랬을 테지만 요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 먹어대긴 했다. 그나마 주위엔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했으니 그저 밥을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상님 덕이려니 하고 행복하게 여기던 시절이었으니 말해 무엇 하리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땐 죄다 그렇게 먹보들이어서 아버지에 전보성대 같은 아들만 다섯이고 일꾼 형들과 할머니, 엄니, 여동생까지 식구들이 드글드글한 까닭에 매 한 끼 짓는 일이 큰 행사였을 정도로 가마솥이 가득 했다. 당시 늘 듣던 말이 "우라지게 쳐어~먹고우라지게 쳐어~싼다."였는데 과연 그랬다. 요즘 기준으로 어른이 하루 200g 이하의 똥과 1.5ℓ가량의 오줌을 눈다고 한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많이 싸는 법. 내가 한창 먹어대던 1960~70년대만 해도 지금보다 네 배 정도 먹었으니 '싸는 양'은 적어도 지금보다 두 배는 됐을 테다. 하루 한 사람이 400g씩의 똥과 1.5ℓ씩의 오줌을 배출한다고 치면 줄잡아 열 네댓이 부닐던 우리 집 둑간에선 날마다 똥 5.6~6㎏, 오줌 21~22.5ℓ의 거름을 생산했던 셈이다. 여기에다 매일 아침 아궁이에서 나오는 재가 줄잡아 한 삼태기이니 두 말가웃은 실히 됐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박제가(朴齊家)의 주장을 되새겨 보자. "대략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배설하는 똥과 오줌으로 하루 먹을 곡식은 넉넉히 생산하는 것이니, 백만 섬의 똥을 버리는 것은 백만 섬의 곡식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해마다 2t 이 넘는 똥과 7.6㎘의 오줌**을 버리지 않고 거름으로 이용했으니 우리 집이야말로 박 선생한테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 실제로 우리 집에선 똥재는 이른 봄 보리밭 추비(追肥)와 목화밭엔 기비(基肥)로 쓰고, 감자를 심을 때는 조각낸 씨감자를 함께 버무려 소독 겸 비료로 썼다. 또 한껏 묵혀 발효시킨 숙분은 호박이나 오이, 그리고 과수 둘레에 구덩이를 파고 부은 다음 덮어주면 그렇게 효과가 좋을 수 없었다. 밭에서 난 것을 먹고 배설한 똥과 오줌을 다시 밭에 돌려준다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생태 순환인가. 대학시절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다음 날 수업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퀴퀴한 냄새가 난다며 놀려도 부끄럽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이런 생각에서였다.
*여기서 '쳐어~'는 요즘 젊은 세대가 흔히 쓰는 '개맛있다'의 '개'처럼 강조접두사이다. 그냥 '처먹다'가 '먹다'의 비속어인 것과는 다른 표현이다. '그 집에 가려면 쳐올라가야 돼.' '너네 닭은 왜 그렇게 쳐울기만 하냐?'에서 등등처럼.
**특히 우리 엄니의 오줌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아들을 많이 났기 때문에 고추, 오이, 일년감(토마토) 등 열매 작물에 특효가 있을 것이란 믿음(類感呪術)에서였다. 농사철이면 동네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한 두 바가지씩 얻어다 자기네 오줌과 섞어 작물에 주곤 했다.
#똥·오줌 타령을 하면서 '이동식 뒷간'이랄 수 있는 '요강' 또한 빼어놓을 수 없다.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지만 예전엔 방마다 떡하니 윗목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필수품*이었다. 뒷간이 대부분 거주 공간과 떨어진 곳에 있는 까닭에 거동이 힘든 노인과 어린애 등의 볼일을 위해서, 그리고 한 겨울이나 어두운 밤 뒷간에 가기 거북할 때 요긴하게 쓰였다. 요강은 한자어 '尿缸(요항)' 혹은 '溺缸(요항)'에서 유래된 말로 조선시대에는 이밖에 '溺釭(요공)',' 溺江(요강)', '褻器(설기)', '溲甁(수병)', '夜壺(야호)' 따위로 적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溺器(요기)'란 표기도 보이고, 특히 궁중에서는 '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일반에서는 '오줌단지', '오줌통', '오줌그릇' 등으로 불렀고, 경기·강원 지역 사투리로 '오강'이 있다. 요강의 원조는 앞에서 소개한대로 중국 황실에서 쓰던 호랑이 대가리를 닮은 '호자'**이다. 가장 오래된 유물로 한나라 때 호자가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충청남도 부여읍 군수리에서 발굴된 백제 때 호자(높이 25.2㎝)이다. 군수리 유적에선 깃봉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꼴도 여럿 나왔다. 똥·오줌을 비료로 쓰기 시작한 고려 중기 이후 이를 모으기 위한 뒷간이 늘어나면서 요강사용이 줄기는 했지만 쓰임은 여전했다. 13세기까지 양반들은 대개 큰 것이나 작은 것 모두 요강에서 해결했고, 일반 백성들도 대부분 그냥 밖에서 해결했지만 요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강은 방 안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가마를 타고 길을 가다가도 오줌이 마려우면 사용하기 위해 하인으로 하여금 망태기에 요강을 넣어 메고 따라다니게 했는데 이를 '길요강'이라고 했다. 사대부집 여인네들의 경우 나들이할 때 아예 작은 요강을 만들어 가마 안에 넣어두고 다녔다. 그런데 놋요강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를 꺼려 한지에 기름을 먹여 새끼를 꼬아 만든 '지승(紙繩)요강'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승요강은 특히 시집가는 색시 가마에 많이 사용됐는데 소리가 나지 않게끔 바닥에 짚을 깔았다. 조선시대에는 놋요강*** 말고도 청자·백자·목칠(木漆)요강도 쓰였고, 백성들은 오지나 사기로 된 것을 주로 썼으며 제주도에서는 바가지****도 요강으로 썼다. 근래에는 양은, '스뎅'으로 된 것도 한동안 사용됐다. 사기요강에는 화접문(花蝶紋)이나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 따위를 그려 넣은 까닭에 '꽃요강'이라고도 불렀는데 대야와 함께 서민층 신부의 혼수품으로 꼽혔다. 『산림경제(山林經濟)』에도 "살림형편이 어려우면 대야 대신 요강 둘을 마련해 준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젊은 부부용이고 다른 하나는 시부모를 위한 것이다. 어머니는 딸에게 요강을 물려주었으며, 신혼부부는 첫날밤 이 안에 촛불을 밝히고 잠을 잤다. 또 이것을 부부가 함께 썼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깨뜨리는 행위를 인연을 끊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놋요강과 놋대야가 으뜸 혼수품이었고, 큰 부잣집에서는 요강을 닦는 일만 맡은 '요강담살이'라는 종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중국 관리들은 우리 요강을 몹시 탐냈다. 『효종실록孝宗實錄』 9년 3월 11일자 기사에 "청의 권력자인 어응거대(於應巨大)가 우리에게 재차 요강을 요구합니다. 그 말고도 중국의 크고 작은 벼슬아치들이 보기만 하면 요강을 달라고 합니다."며 박지원朴趾源(1737~1805)이 효종에게 아뢴 내용이 있을 정도다. 경상도에서는 신행 때 요강에 찹쌀을 가득 담아 가서 밥을 지어먹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찹쌀에는 농사의 풍년과 자손의 번성을 바라는 뜻이 들어 담겨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장에서 박으로 만든 과장호자(科場虎子)를 썼다. 시험 도중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간혹 이 안에 예상 답안을 넣고 들어가서 급제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를 일러 '호자당상(虎子堂上)'이라고 비웃었다고 한다.
*그 유명한 김삿갓(본명 金炳淵· 1807~1864)이 요강의 공덕(?)을 기리는 시를 남겼다.
'요강 덕분에 밤중에도 귀찮게 드나들지 않으니(賴渠深夜不煩扉)/ 편히 누운 자리에 가까이 있어 매우 고맙구나(令作團隣臥處圍)/ 주정꾼도 네 앞에서는 단정히 무릎 꿇고(醉客持來端聃膝)/ 어여쁜 계집 앉을 때 샅 보일까 조심스레 속옷 걷누나(態娥挾坐惜依收)/ 똥똥하고 단단한 생김새 유명한 안성맞춤인데(堅剛做體銅山局)/ 쏴 하고 오줌 누는 소리 흰 폭포 나는 듯(灑落傳聲練瀑飛)/ 가장 큰 네 공은 비바람 치는 새벽에 빛나고(最是功多風雨曉)/ 모든 곡식의 거름 되어 사람 살찌우는 것이로다(偸閑養性使人肥).'
**호자의 유래가 재미있다. 그 옛날 중국에는 '린(麟)'이라는 상상 속 동물이 있었다. 얼핏 보면 모습이 실재하는 기린과 닮았지만 사람들은 이 '린'을 동물 중의 으뜸으로 추앙했고, '린'이 나타나면 성인(聖人)이 탄생할 길조(吉兆)라고 여겼다. 그런데 '린'은 오줌이 마려울 때 호랑이가 엎드려서 옆으로 고개를 돌린 채 입을 벌리면 그 속에다 대고 누었다고 한다. 이런 전설에 따라 소변기는 호랑이의 머리를 닮은 모양을 하게 됐고 이를 호자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황제가 호자를 사용함으로써 '린'과 동격의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고 백성들의 존경과 충성을 종용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설화로 보인다. 한나라 무제(武帝)는 옥으로 된 변기를 사용했으며 일을 마치면 시종(侍從)이 뒷처리를 했다. 무제의 변기를 두는 곳을 '헌중(軒中)'이라 했는데 '헌'은 나중에 쓰인 칙(厠)과 같은 뜻이다. 한편 이에 앞서 주나라(기원전 1027~771) 때는 '위유(威宥)'가 있었는데 위는 호자와 같은 변기를 뜻하고 유는 구멍을 팠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구리로 요강을 만든 까닭에 율곡 이이(李珥·1536~1584)가 왕에게 "백성들이 낭비를 즐긴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어린 '잠수(潛嫂·해녀)'들은 물질할 때 쓰는 뜨개박을 시집갈 때 요강 삼아 가져갔다. 바닷물에 찌든 바가지는 나무처럼 단단해서 쓸 만했는데 이것이 깨지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간다고 하여 엉거주춤 앉아서 누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에선 어땠을까. 옛날 중국에선 규방마다 변기를 두고 이를 청유(淸鍮)라 했다. 오늘날 중국에선 요강을 '마통(馬桶)'이라고 하는데 위(魏ㆍ기원전 220~265)나라 때 나무를 파서 만든 변기가 효시이다. 호자가 소변기라면 마통은 대소변 겸용이다. 고대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변기가 마통이다. 마통은 높이 40cm가량의 생맥주통을 닮은 용기로 대개 붉은 칠을 하고 허리춤엔 구리로 띠를 둘렀다. 뚜껑엔 금속으로 장식을 하기도 했다. 마(馬)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을 탄 것처럼 앉아서 일을 보게 돼 있다. 마통은 마자(馬子), 정통(淨桶), 변통(便桶), 마통아(馬桶兒)란 별칭도 있다. 낮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었다가 밤이 되면 침상 옆에 두고 사용했다. 진(晉), 당(唐)시대에는 궁정과 귀족들이 칠보로 장식한 변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마통 풍속은 계속 이어져 중화민국 초기에도 대학교에 들어간 여대생들이 기숙사 건물에 화장실이 없자 개인 침대 아래에 마통을 숨겨놓고 해결했다고 한다. 또 민국 시대에 유명했던 여자영화배우 진연연(陳燕燕)이 자동차를 탈 때면 반드시 마통을 가지고 다녔을 정도다. 오늘날에도 어린이용으로 플라스틱 마통이 만들어져 유통되는데 색깔은 여전히 붉은 색이다.
#일본 역시 근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똥오줌을 누는 게 보통이었다. 당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노상에서 방뇨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어 자기 나라에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교토(京都)에는 '분소로(糞小路)'라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거리가 바로 공중 화장실처럼 누구나 가서 똥과 오줌을 누었기 때문이다. 이 거리에는 언제나 똥과 오줌이 넘쳐 누구든 이 거리로 들어갈 때에는 신고 갔던 신발을 벗고 입구에 놓여 있는 굽 높은 나막신으로 바꿔 신고 들어가야 했다. 일본 사람들이 굽이 높은 게다*를 신게 된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천황(天皇)이 우연히 이 거리를 지나다 그 내력을 듣고 거리 이름을 바꾸도록 지시해서 오늘날의 금소로(錦小路)가 됐다고 한다. 일본에선 일반 백성들의 경우 나무 요강을 많이 썼는데 길거리에 내다버렸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메이지(明治)3년(1870) '방뇨 취제의 포고'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요코하마의 경우 시내에 83곳의 노방(路傍)변소가 만들어졌다. 이 노방변소는 일본 최초의 공중변소였는데 큰 변조를 땅에 묻고 그 주위를 판자로 막은 어설픈 것이었다. 하지만 이깥은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고하고 노상방뇨의 풍습은 쉽게 근절(根絶)되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선봉으로 쳐들어왔던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加籐淸正)는 화장실에 갈 때 굽 높이가 한 자(30cm)나 되는 '아시다(あしだ·足駄 :비가 와서 길이 질척거릴 때에 신는 굽 높은 왜나막신. =たかげた),↔こまげた)'를 신고가곤 했다고 한다.
#서양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요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배설하는 행위를 감추기 시작했고, 16세기 유럽 사람들은 벽장 속에 변기나 요강을 들여 놓았다. 헨리 8세는 2천개의 황금 못을 박아 넣고 검은 우단으로 장식한 뚜껑 달린 변기를 이용했으며, 화장실에 가느라 대화가 끊기는 것이 불만이었던 루이 14세는 요강에 앉아 볼일을 보면서 손님을 맞았다고 한다. 중세부터 근대 초기까지는 로마 제국 시대 당시의 하수도 기술*이 실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도자기 요강을 집집마다 갖고 있었다. 그리고는 매일 요강의 오물을 길에 버렸고, 이 때문에 골목골목이 똥오줌으로 넘쳐났다. 특히 비오는 날이면 동물과 사람의 분뇨, 거름, 길 위의 오물들이 뒤섞여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 이런 악취 때문에 건물 뒤편엔 창문도 없었다. 거리에 넘쳐나는 오물 때문에 사람들은 굽이 높은 나무 신**을 신었다. 유행에 민감한 일부 시민들은 값비싼 가죽구두에 오물을 묻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나무 신을 신었다. 더욱이 중세 후기에 이르러 위생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먹고살기 위해 농촌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들을 위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4~5층짜리 공동주택들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위층에 사는 주민들은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더 귀찮아져서 요강에 든 똥오줌을 창밖으로 쏟아버리곤 했다. 그렇다고 마구 쏟아버리는 것은 아니고 길가에 파놓은 도랑에 버리는 것인데 조준을 잘못 하거나 실수로 요강을 떨어트리면 밑을 지나던 행인이 오물을 뒤집어쓰는 봉변 사고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이를 막으려고 꼭대기 주민들은 요강을 비우기 전에 밖을 향해 반드시 사전 경고를 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프랑스 파리에선 "Gardez l'eau!(물 조심하세요!)"하고 세 번 외친 다음 오물을 쏟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풍습이 다른 나라들에도 전해져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말이 됐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Gardy loo!"라고 했다. 전해지는 과정에서 말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물'을 뜻하는 l'eau가 '화장실'을 뜻하는 'loo'로 바뀌었다. '로'에서 '루'로 발음이 살짝 변했을 뿐이지만 "물 조심하세요!"가 화장실, 즉 "똥오줌 조심하세요!"로 바뀐 것이다. 또 위에서 아래로 오물을 버리면서 "Watch out bellow!"라고 외침으로써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던 말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서 "조심하세요!"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요강(Chamber pot)을 제리(Jerry)라고도 부르는데 중세 유럽에서는 집밖으로 나와 시장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대소변이 마려워 다급한 사람들을 위해 휴대용 요강을 들고 다니며 돈을 받고 해결(?)해주는 장사꾼도 있었다. 독일에서는 '압트리트안비터(Abtrittanbieter)'라고 불렸는데 오늘날의 이동식 화장실 서비스의 선구자인 셈이다. 이들은 넓고 두꺼운 망토를 착용하고 나무로 만든 두 개의 통을 들고 다니면서 손님이 있을 경우 망토 안에서 용변을 해결하도록 했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에 연합군측이 독일군의 헬멧인 '슈탈헬름(Stahlhelm)'이 마치 요강을 닮았다고 해서 독일인에게 '제리'라는 별명을 붙였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하수도 시설이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공공시설이나 고급 주택인 도무스(domus)나 빌라(villa)에 한정된 얘기이고, 서민 아파트인 인술라(insula)에는 하수도가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창문 밖으로 요강에 든 똥오줌과 온갖 쓰레기를 내다버렸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이걸 맞고 다치거나 죽는 사고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인술라 밑을 지나갈 때 조심하라는 내용의 시(詩)가 유행하기도 했고, 로마 당국도 '오물 무단 투척 금지법(Deiecti Effusive Actio)'을 만들어 단속하곤 했다. 또 벽에는 'Cacator(똥 누누는 자), Cave malum(오물 조심)'이란 글씨를 써놓았는데 우리네 골목에서 가위 표시와 함께 흔히 볼 수 있었던 '소변금지'란 경고(?)낙서와 닮은꼴이다.
**신발이 똥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하이힐(high heels)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는 민속학자 에두아르 푹스(Eduard Fuchs)가《풍속의 역사》에서 한 주장인데 하이힐은 당시 멋쟁이 여성들이 키를 높여 보이려고 신은 것이고, 정작 똥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굽 높은 게다와 비슷하게 생긴 '패턴(patten)'이란 나무 신을 신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세식 화장실은 1775년 영국의 시계 기술자 알렉산더 커밍스(Alexander Cummings)가 처음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기 배수관에 S자 모양의 트랩을 만들어 악취가 실내 공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뒷간을 실내의 한 공간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대식 도시문명의 청결함을 가능케 했다.
우리나라에 수세식 변기가 들어온 것은 일제 강점기로 특급호텔이었던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에 처음 설치됐다고 한다. 이때 변기는 이른바 '화변기(和便器)'* 양식으로 쪼그리고 앉아 일을 본 뒤 물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좌식 양변기는 1945년 이후 미군정 시절 호텔, 백화점, 빌딩 등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퍼져나갔다. 수세식 화장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이 한창이었던 1970년대 중반부터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1972년 서울시내 화장실 중 수세식은 놀랍게도 7%에 불과했지만, 1990년 전체 가구 화장실의 수세식과 재래식 비율은 51:48**이었다가 1995년 75:24, 2000년 87:12, 2015년엔 98:1로 줄어 지금은 대부분이 수세식으로 바뀌었다.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왜변기(倭便器)라고도 한다. 중국어로는 '쭈그려 앉는 변기'라고 해서 '둔볜치(蹲便器·준변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일을 볼 때 스쿼트하는 자세라고 해서 'squat toilet'이라고 한다.
** 영화 '라붐(La Boum)' 시리즈를 통해서 큰 인기를 얻어 1980년대 브룩 쉴즈(Brooke Shields), 피비 케이츠(Phoebe Cates)와 함께 중고생 책받침 스타 3인방 가운데 하나였던 배우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Sophie Marceau)가 1989년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 촬영을 위해 내한, 서울 근교 시골에서 촬영 도중 급히 볼일을 보러 민가에 들렀다가 기겁하고 뛰쳐나오게 한 것이 바로 재래식 뒷간이었다.
#배변의 문제는 이렇게 거대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가 겪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요즘은 화장실(化粧室)이란 말이 대세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소(便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둘 다 한자식 표현이지만 근본적으로 배변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 화장실은 문자 그대로는 '화장을 고치는 방'이다. 영어 'toilet room'를 일본에서 '문자 직역'한 용어다. toilet의 어원은 '화장, 치장'이라는 뜻의 불어 'toilette'인데 유럽에서 머리에 뿌린 파우더를 씻는 것에서 비롯됐다. 따로 파우더를 씻어 내리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를 toilette의 복수형 'toilettes'로 썼으니 결국 '화장실'이란 용어의 유래인 것이다. 예전엔 변소에 가면 문짝마다 큰 글자로 'W.C'라고 표기돼 있는 것도 흔했는데 이는 'Water Closet'의 영국식 표현이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선 'Washington College'라고 하고, 술집에선 '多拂流視(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눈이 자주 가더라!)'로 재번역(?)돼 웃음을 주기도 했다.
한편 '便所'는 '변을 보는 곳'이란 뜻인 바 '便'자는 똥(糞, 屎)과 오줌(尿)을 아우르는 말로 '편안하다'는 뜻으로 쓰일 땐 '편'으로 읽는다. '便'자는 '人(사람 인)'자와 '更(고칠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更'자는 탁자와 채찍을 함께 그린 것으로 '고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便'자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말하는 불편해한다는 것은 대소변을 의미한다. 이렇듯 '便'자는 본래 '똥오줌'을 뜻했었다. 참았던 대소변이 해결되면 몸과 기분이 편해질 것이고, 그래서 '便'자는 '편하다'라는 뜻도 갖게 됐다. 변소의 의미를 극대화한 게 '해우소(解憂所)'란 표현이다. 통도사 극락암의 호국선원 조실로 있던 경봉(鏡峰)스님이 똥 누는 곳에 '해우소'란 팻말을, 오줌 누는 곳에 '휴급소(休急所)'란 팻말을 붙이게 했는데 해우소는 '근심거리를 해결하는 곳'이요 '휴급소'는 '급한 마음을 쉬는 곳'이란 뜻이다. 이 얼마나 멋드러진 말인가. 휴급소에서 급한 마음을 쉬게 하고, 해우소에서 근심을 털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도를 닦는 일 아니던가. 우리가 흔히 정의고 뭐시깽이고 이익을 좇아 희번덕 변하는 마음과 세태를 나무랄 때 '뒷간에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비아냥거리는데, '갈 때 마음'은 근심 가득 '만우(滿憂)' 요, '올 때 마음'은 근심 뚝 '해우'이니 '변소'에 갔다가 '편소'에서 오는 고상한 경지를 못 되게 써먹는 비유다. 지금도 전남 승주 선암사에 가면 해우소가 있어 똥을 누면서 도를 생각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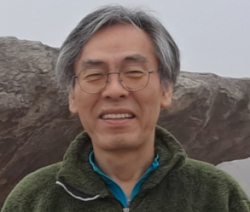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항공사에 다니다 1982년 중앙일보에 신문기자로 입사했다. 주로 사회부,문화부에서 일했다. 법조기자로 5공 초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철희ㆍ장영자 사건을 비롯,■영동개발진흥사건■명성사건■정래혁 부정축재사건 등 대형사건을, 사건기자로 ■대도 조세형 사건■'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유명한 탄주범 지강현사건■중공민항기사건 등을, 문화부에서는 주요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들을 시리즈로 소개했고 중앙청철거기사와 팔만대장경기사가 영어,불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 30개 언어로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엔 초짜기자임에도 중앙일보의 간판 기획 '성씨의 고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1990년대 초에는 국내 최초로 '토종을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종자전쟁에 대비를 촉구하는 기사를 1년간 연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토종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밖에 대한상의를 비롯 다수의 기업의 초청으로 글쓰기 강의를 했으며 2014인천아시안게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