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들의 필수품이라고 해서 '농의' (農衣)라고도 불려
근대식 우산은 19세기초 선교사들이 들여온 것으로 추정

한가위가 코앞인데 하늘이 아직도 끄물끄물하는 게 언제라도 한 소나기 할 태세다. 가을비가 잦은 것도 예전엔 영 낯선 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잦은 치레가 되다보니 이젠 내남없이 으레 그러려니 한다.
비도 그냥 적당히 부슬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한 여름만큼이나 세찬 빗줄기로 저물어가는 생명들을 두들겨대니 어이가 없다. 가을비는 모름지기 추적(秋滴)추적해야 하는 법인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랑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비만 오시면 우산이 생각나고 우산 하면 떠오르는 동요다. 윤석중 선생의 시에 이계석 선생이 곡을 붙여 1948년 발표된 노래로 제목은 〈우산〉. 시골뜨기인 탓에 비록 멋진 우산 대신 비료부대를 뒤집어쓰고 학교를 다녔어도 비가 오시기만 하면 '나지오'를 통해 숱하게 들었던 노랫가락이 떠올라 그 시절 고통의 흔적들을 포근하면서도 풋풋한 기억으로 치환해주는 마법 같은 노래다.
#사실 햇빛이나 비를 막는 우산의 옛 형태 자체는 기원 전 1200년 고대 이집트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메소포타미아 기록에서도 우산이 보이지만 이것은 왕족과 귀족들이 햇빛을 가리는 양산 용도였고,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왕조 8대 황제 크세르크세스 1세(Xerxes Ⅰ· 기원전 518~기원전 486년)의 조각에 파라솔의 모습이 등장한다.
중국에서도 기원전 1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평양의 낙랑시대 왕광(王光)의 무덤에서 접이식 파라솔이 발견되는데, 나중에 유럽에서도 귀부인이 햇빛을 피하는 양산으로 더 써왔다. 우산을 뜻하는 영어 'umbrella'가 라틴어로 그림자를 뜻하는 'umbra'에서 유래된 사실이 저간의 사정을 말해준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선 우산의 사용에 대해 남녀의 인식이 달랐다. 남성에겐 나약함의 상징이어서 우산 대신 모자를 사용하거나 비를 그대로 맞았지만, 여성들에겐 여전히 부를 상징하는 액세서리였다.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오래되고 생생한 실물은 중국 진시황릉(秦始皇陵) 병마용갱(兵馬俑坑)에서 출토된 동거마(銅車馬) 일산(日傘). 고고학계에서 20세기 최대 발굴로 치는 진시황릉 병마용갱(兵馬俑坑)에서 나온 이 구리 수레에는 의자에 고정 설치된 동산(銅傘)이 있는데 실물의 절반 크기로 2000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생동감을 준다. 수레의 전체 길이는 2.25m, 높이는 1.52m, 무게는 1067kg으로 수레 안에는 십자공(十字拱)형태의 산좌(傘座)가 설치돼 있고, 의자에는 긴 자루가 달린 동산(銅傘)이 세워져 마치 파라솔처럼 햇빛가리개 구실을 하고 있다. 산의 자루는 대나무 마디처럼 만들어 속이 비어 있고 모두 22개의 살 위에 청동판(靑銅鈑)으로 덮어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 이미 햇빛 가림용 일산이 쓰여 고구려 고분 벽화에 실생활에 쓰던 모습이 남아있다. 408년이란 연대와 묻힌 인물의 실명이 밝혀진 것으로 유명한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 고분의 통로 동벽에는 묘주(墓主) 부부의 출행 장면 그림이 있는데 상단에는 여자 주인공이 탄 우차(牛車)의 행렬 모습을 그렸다. 행렬의 맨 앞에는 남자 시종들이 녹색으로 채색된 우차를 몰고 있고 그 뒤에는 색동주름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여자 시종 둘이 수레 옆을 바짝 따라가고 있으며, 하녀들의 뒤에는 커다란 검은색 산개(傘蓋ㆍ귀족들이 나들이할 때 태양을 가리기 위해 받치는 우산)를 든 남자 시종이 행여나 귀부인이 탄 수레 행렬을 놓칠세라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또 중국 길림성 집안시 황백향 장천촌에 위치한 장천(長川)1호분의 앞방 동쪽 천장에 그려진 궤배예불도(跪拜禮佛圖)에도 일산이 나온다. 그림의 중앙에 선정인(禪定印) 자세의 불상이 놓여있고, 그 오른쪽에 남녀 한 쌍이 허리를 굽혀 불상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 왼쪽에는 일산(日傘)을 든 남녀가 공양을 드리고 있고, 뒤에 시녀들이 서있다. 주위는 비천과 연화문으로 장식했다. 이밖에 중국 길림성 지안시에 있는 삼실총(三室冢) 제1실 남쪽벽의 출행도(出行圖)에는 양산을 든 두 사람과 뒤따르는 하인을 제외하곤 모두 양손을 가슴에 모은 자세를 취해 고구려인들의 특유의 습속인 '행필삽수(行必揷手·걸을 때 두 손을 소매 안에 넣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이 고대의 우산은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하늘, 권위, 죽음 등의 상징으로 이용됐는데 때로는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명나라 때 황제는 커다랗고 붉은 비단 우산 2개를 들고 다녔고, 고위직은 붉은 비단으로 안감을 대고 주름 장식을 단 검은 우산, 양반은 조롱박 모양 주석 손잡이가 달린 붉은색 우산, 천민은 종이로 만든 우산을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 장량항우산(張良項羽傘)이란 게 있었는데 일산과 우산의 겸용으로 벼슬아치만 외출할 때 사용했다.
#우산을 순우리말로 '슈룹'이라고 한다. 《훈민정음 해례본》(1443)에 '비를 막는 것(爲雨繖)', 즉 우산을 '슈룹'이라고 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앞서 북송의 손목(孫穆)이 서장관으로 고려를 방문해 당시 고려의 제도와 풍속, 방언 등을 기록한 《계림유사(鷄林類事)》(1103)에는 '산왈취립(傘曰聚笠)', 15세기 말 중국 회동관(會同館)의 통사(通事)들이 사용한 한·한 대역어(韓·漢對譯語) 어휘집인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에는 '산왈속로(傘曰速路)'라고 기록돼 있어 우산에 대해 '슈룹'과 비슷한 발음의 어휘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산은 궁중이나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농자천하대본인 사회에서 비는 소중한 존재였기에 백성들이 '하늘이 내리시는 신성한 비'를 감히(?) 우산으로 막거나 피한다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도롱이, 삿갓 등으로 비에 대비했다.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 중에 호미 메고/산전을 흩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목동이 우양을 몰아 잠든 나를 깨와다'
시조집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실려 있는 김굉필(金宏弼·1454-1504)의 시조이다. 무오사화(戊午史禍)에 연루돼 귀양살이를 하면서 전원의 삶을 읊은 시조로 당시 여름 생활필수품이던 삿갓, 도롱이가 나온다.
예전엔 비를 직접 맞지 않고 피하기 위해 쓰는 걸 우장(雨裝)이라고 했다. 요즘 같은 우산이나 우비가 아니라 주로 짚과 풀로 엮어 만든 것으로 우리말로 '누역'이라 하고 도롱이 사(簑)자를 써서 사의(簑衣)나 우의(雨衣), 또는 농사꾼의 필수품이라 농의(農衣)라고도 했다. 우장은 머리로부터 쓰는 것과 어깨에 걸치는 것 두 가지가 있었다. 머리로부터 쓰는 걸 '접사리'라 하고, 어깨에 걸치는 것을 '도롱이'라고 하는데 도롱이는 머리에 따로 삿갓을 써야 했다. 도롱이는 안쪽은 빤빤하고 겉은 자락을 줄지어 내리덮어 빗방울이 흘러내리도록 어깨를 둘러 덮는 우비다. 앞도 막히지 않고 소매도 없으나 대부분 삿갓을 쓰고 엎드려 일하는 동안 쓰는 것이라 그것이 오히려 편하고, 날이 들면 그늘에 펴고 그 위에 앉아 쉴 수 있는 깔개로도 쓰였다. 우장을 만드는 재료로는 볏짚과 밀짚, 보릿짚, 그리고 띠, 부들, 줄 등 풀이 쓰였는데 가장 쓸 만 한 건 띠였다. 볏짚은 흔한 재료로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습기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강해 빗물이 쉬이 스미는데다 무거워 비옷으로는 젬병인데 반해 띠는 기럭지가 볏짚만큼 되는데다 방수력(防水力)이 뛰어나고 가벼워 으뜸으로 쳤다. 띠는 벼과에 속하는 다년생 잡초로, 4~9월에 생장하며 키는 30~80cm 정도여서 지붕을 덮는 이엉재료로도 쓰였다. 옛 시문에 흔히 나오는 모옥(茅屋)이 바로 띠로 지붕을 덮은 집이다. 밀짚과 보릿짚도 방수성이 좋고 가볍기는 하나 착용감이 떨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우장이 농민뿐만 아니라 사대부 양반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어서 궁중에서 사용하는 양도 제법 많았다. 백성들한테서 납품받아 특별히 공을 세운 신하나 중책을 띠고 먼 길을 떠나는 암행어사 등 관리에게 왕이 하사하곤 했다. 한편 이 같은 누역은 비를 피하는 용도 말고도 헐벗은 사람이 옷 대신 몸을 가리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9년 4월 20일자 기사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그 때 한창 성을 쌓느라 변방 백성들이 대단히 곤란해, 혹은 도롱이를 입어 알몸을 가리고, 혹은 흙을 먹어 배앓이를 하며, 혹은 돌림병으로 죽기도 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 도롱이와 함께 쓰는 삿갓은 대오리나 갈대, 부들 등으로 만드는데 재료에 따라 늘(부들)을 원료로 한 늘삿갓, 가늘게 쪼갠 댓개비(대오리)를 가지고 만든 대삿갓 및 세(細)대삿갓 등으로 분류된다. 비가 오지 않는 평소에도 햇빛을 가리거나 내외용 얼굴 가리는 용도로도 쓰였다. 한자어로는 노립(蘆笠) 또는 농립(農笠)·우립(雨笠)·야립(野笠) 등으로 불린다.
#조선시대에 남성들이 갓을 쓰는 것은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매무시를 바르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옷차림이다. 그러나 갓으로는 비를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말총으로 엮은 갓은 그저 '의관정제(衣冠整齊'를 위한 것일 뿐이다. 이를 보완한 것이 바로 '갈모'이다. 갈모는 원래 갓 위에 쓰는 '갓모자(笠帽)'에서 나온 이름으로 비가 올 때 갓 위에 쓴다 해서 우모(雨帽)라 하고, 기름종이로 만들어 '유모(油帽)'라 부르기도 했다. 갓 위에 덮어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펼치면 고깔 모양이 되고, 접으면 쥘부채처럼 된다. 갓을 눌러 갓이 쭈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무겁지 않은 재료인 기름 에 결은 한지(갈모지)로 만들었다. 때론 방수력을 높이기 위해 옻칠을 하기도 했다. Y자 형으로 끈을 달아 턱 아래서 맸다. 갈모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갓은 조선 초기부터 사용했으며 선조 때 이제신(李濟臣 ·1536~1583)의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鯸鯖瑣語)』에는 명종 때를 전후한 입제(笠制)의 설명 가운데 우모(雨帽)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이미 조선 중기에는 갈모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말에는 요즘 군인들이 쓰는 판초(poncho) 같은 우비도 있었는데 종이나 천에 기름을 먹여 어깨를 둘러 상반신을 덮게 만든 유삼(油衫)으로, 망토같이 생겼다. 이 같이 아주 짧은 망토처럼 만든 서양식 우비, 즉 판초를 예전엔 견폐(肩蔽)라 불렀다. 또 우리의 유삼과 비슷한 '가빠(capa)'라는 비옷도 있었다. 기름에 결은 얇은 천이나 종이로 만들어서 착착 접어 지닐 수 있는 것이 유삼과 똑같은데 일본사람들이 합우(合羽)라고 불렀으나 본래는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들여온 망토를 그네들 말로 '가빠'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가빠가 일본에 들어와선 순전히 우비로만 쓰였다고 한다.
#조선말에 이르러서야 삿갓이나 도롱이로 비를 피하던 서민들에게도 '지우산(紙雨傘)'이 보급됐다. 지우산은 닥나무로 만든 종이에 기름을 먹이거나 밀랍을 칠해 빗물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작된 우산으로 중국에서 발명돼 우리나라, 일본을 거쳐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 각 나라 지역적 특성에 맞게 만들어졌다. 지우산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도 그 모양이 서술돼 있는데 1960년대 이후 비닐우산과 천 우산 등에 밀린데다 나중엔 중국산 싸구려 지우산의 공세로 생산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최근 전통문화 살리기에 힘입어 제작기술이 복원돼 개당 수십만 원에서 파라솔 같은 대형 지우산은 수백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유럽에서 실용적인 우산이 처음 등장한 것은 프랑스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1680년 프랑스어 사전에 '우산(parapluie)'이란 용어가 실렸기 때문이다. 또 우산이 대중적으로 쓰인 것도 1709년 장 마리우스(Jean Marius)라는 기술자가 접이식 우산을 발명해서 루이 14세가 귀족들에게 유행시킨 18세기경 프랑스에서부터라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심지어 이것도 귀족들 사이에서의 유행이었고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다. 영국은 우중충한 날씨와 함께 비가 자주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프랑스 보다 우산 사용이 늦게 시작했다. 당시 영국 남자들은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는 건 '비겁한 행위'라는 게 이유였다. 또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망상자이거나 옷이 망가질까봐 유난을 떠는 좀팽이, 마차도 없어 '별 볼일 없는 놈'일 것이라는 편견도 작용했다. 이에 병원 경영자이자 여행가인 조나스 한웨이(Jonas Hanway)는 이 같은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고 1750년경부터 30년간 매일같이 우산을 들고 다녔다. '우산이 나약한 사람들의 물품'이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이 영국인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남자들은 우산을 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산이 영국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데는 엉터리 고정관념 말고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보행로는 너무 좁아터져 한 사람씩만 지나갈 수 있었고, 우산은 비싼 값에 비해 질이 형편 없었다. 초기 우산은 자루와 살을 고래뼈로 만들어 무거운데다 툭하면 잘 부러지고, 천도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산을 서도 젖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하여튼 유럽에서 일반 사람들까지 우산을 애용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반 무렵이고, 1850년대 이후에나 생활필수품으로 대중화됐다. 우산이 등장한 초기엔 지위와 부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에 근대식 우산이 들어온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얼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을 하던 19세기 초쯤으로 추정된다. 1876~1883년 수신사(修信使)와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본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고, 1882년 4월에 미국 공사가 부임했는데 당시 일본과 미국 등에서 우산은 보편화된 생활용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뤄 알 수 있다. 또 '독립신문(獨立新聞)'에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데 선교사들이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갔다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자주 실렸고, 미국인 선교사들도 우산을 쓰고 다니면 반감을 사 선교가 어렵다고 토로하곤 했다고 한다. 물론 1950년대까지는 부유층의 상징물이었다가 1960년대 넘어서야 대중화됐다. 그렇게 보면 한국 남성들이 편안하게 우산을 들고 비를 반기기까진 영국신사 한웨이보다 250여 년이 뒤진 셈이다.
#우산은 복식의 변화를 보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특히 여성에게 유효했다. 여성 옷차림의 획기적인 변화는 장옷과 쓰개치마를 벗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출입할 때 내외법에 따라 얼굴을 가리는 쓰개치마와 장옷을 입었다. 사대부 집 여성들은 장옷, 쓰개치마는 서민 여성들이 주로 사용했다. 여성들에겐 일종의 굴레로 개화기 때부터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신식 여학교 학생들도 장옷을 입고 학교를 다녔다. 1911년 배화학당에서 학생들의 쓰개치마 사용을 교칙으로 금지하자 자퇴하는 일이 생겨 대신 검정 우산을 줘 얼굴을 가리고 다니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학생들과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 검정우산이 크게 유행하게 됐는데 이 우산의 펼쳐진 모양이 마치 박쥐가 날개를 펼친 것과 흡사해 '박쥐우산' 또는 '편복산(蝙蝠傘)'이라 불렸다. 이후 여성의 얼굴 가리개는 차츰 양산으로 대체됐으며 목도리와 숄도 이용됐다.
남성들의 경우 1895년 을미개혁 무렵 양복이 공인됐는데 특히 고종과 순종이 전통 옷차림을 벗고 양복을 입어보이면서 권장했다. 대신들도 공식복장으로 관복대신 양복을 입고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강탈된 뒤 민간에도 양복이 조금씩 보급되다가 1920년대에 들면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해 경성과 주요 도시에서 조선인 관리들은 물론 양반과 상인도 양복을 입었다. 이 무렵 양복차림은 셔츠, 넥타이, 티이핀, 커프스, 중절모자, 구두, 스틱, 가죽벨트가 기본 차림새였는데 스틱 대신 우산을 들고 다니는 '모단보이(modern boy)'들도 많았다. 한편 여성들도 남성의 양복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양장을 입기 시작했고 당시 '모단걸(modern girl)'들은 블라우스에 스커트차림을 기본으로 스카프, 장갑, 넥타이에다 다양한 디자인의 서양 모자를 쓰고 양산은 기본 아이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우산문화가 확산, 대중화된 것은 비닐우산 덕분이다. 지우산을 대신해 비닐우산이 처음 등장한 건 1960년경이다. 조선시대 지(紙)우산 모양을 본뜨면서도 기름 먹인 한지 대신 비닐을 입혀 원가를 낮췄다. 값싸고 가벼워 나오자마자 히트 상품이 됐다.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싶다는 요청도 잇따랐다고 한다. 일기예보가 신통치 않던 시절이라 길을 가다 무방비로 비를 만나는 일은 다반사였다.
소나기만 쏟아지면 어디선가 우산 팔이 소년들이 귀신처럼 알고 나타나 "우산이오, 우산!"을 외쳐댔다. 많게는 한 해 동안 수백만 개씩 팔렸던 호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비닐우산의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업자들의 과당경쟁과 '대강대강·빨리빨리' 문화 속에 품질은 점점 더 조잡해져 갔고, 급기야 초기엔 30개나 되던 우산살이 야금야금 줄어들더니 1970년대 후반엔 9개가 됐다. 게다가 시판품의 60~70%는 폐품 우산을 고쳐서 만든 재생품이었다. 이런 날림 우산들은 새로 사 들고 100m도 못 가서 살이 부러지고 비닐이 찢어져 못 쓰게 되기 일쑤였다.
1966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교육자대회 때 기습 폭우가 내린 거리에서 각국 대표들에게 나눠준 비닐우산이 바로 망가져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을 엉터리 우산, 차라리 만들지 말라"는 언론의 탄식까지 나왔다. 결국 등장 20년 만인 1980년쯤부터 대나무 비닐우산의 인기는 곤두박질쳐 그 뒤로 10여년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다 90년대 중반이후 사라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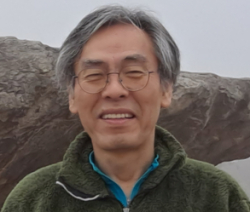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항공사에 다니다 1982년 중앙일보에 신문기자로 입사했다. 주로 사회부,문화부에서 일했다. 법조기자로 5공 초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철희ㆍ장영자 사건을 비롯,■영동개발진흥사건■명성사건■정래혁 부정축재사건 등 대형사건을, 사건기자로 ■대도 조세형 사건■'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유명한 탄주범 지강현사건■중공민항기사건 등을, 문화부에서는 주요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들을 시리즈로 소개했고 중앙청철거기사와 팔만대장경기사가 영어,불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 30개 언어로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엔 초짜기자임에도 중앙일보의 간판 기획 '성씨의 고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1990년대 초에는 국내 최초로 '토종을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종자전쟁에 대비를 촉구하는 기사를 1년간 연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토종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밖에 대한상의를 비롯 다수의 기업의 초청으로 글쓰기 강의를 했으며 2014인천아시안게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