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일찍 발견 못한 주치의에 기관지 의료기기 선물하면서 "다른 환자 위해 기증"
주치의 한용철 "최종건 회장처럼 큰 도량으로 죽음을 대한 환자를 보지 못했다"

최종건의 건강은 오래가지 못했다. 3년 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사를 마친 병원이 암은 아닌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듬해 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청도로 폐에 암이 퍼져 있었다. 최종건은 자신의 운명을 덤덤히 받아들였다. 그는 병문안 온 방일영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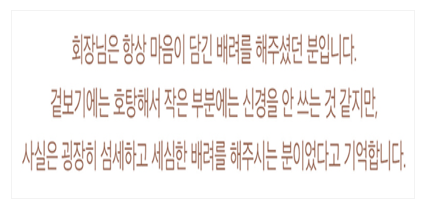
"사실 저는 오늘 죽는다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남보다 두 배는 오래 산 셈이지요 그 누구보다 두 배 이상 열심히 뛰어오지 않았습니까?"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한용철 박사가 병명을 말했을 때, 최종건은 "왜 1년도 안 된 작년 여름에 암인 줄 알고도 확신을 못 내렸느냐?"고 물었다. 한용철은 "일본에서 최근 개발한 파이버스코프가 있다면 기관지 구석구석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기관지경으로는 가시범위가 좁아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2주쯤 지나서 한용철의 방에는 큰 선물 꾸러미가 배달되었다. 비서는 최종건 회장이 보낸 선물이라고만 밝혔다. 병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주치의에게 보낸 선물에 한용철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뜯어보니 파이버스코프였다. 최종건은 짧은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나는 이미 늦었지만 나와 같은 병에 걸려 고통받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증한다."
그가 보낸 선물은 새로운 진단기가 개발될 때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몇 년 동안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폐암 진단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한용철은 "최종건 회장처럼 너그럽고 큰 도량으로 죽음을 대한 환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그를 평가했다.
이처럼 최종건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대한민국과 그곳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것은 그가 몸이 망가질 정도로 사업에 매진한 이유이기도 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