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시민권 인정하는 민권법 거부했다가 의회서 재의결해 '거부권 무효화' 낙인
육군부 장관 해임후 하원서 탄핵안 의결됐지만 상원서 '삼권분립 위배'이유 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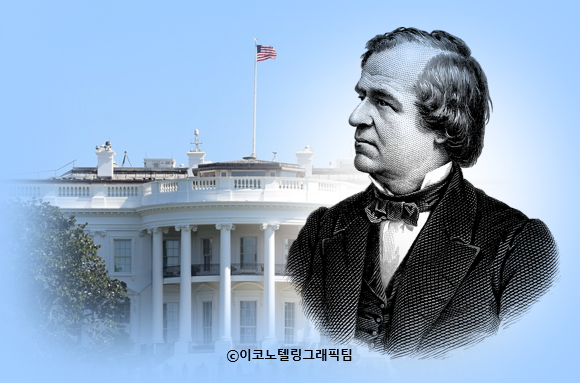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전임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암살되는 바람에 부통령이었던 그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이렇다 할 존재감도 없고, 미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꼽히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탄핵의 표적이 되었던 '대통령'이란 점이 이야기거리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혼란스러운 인물이다. 『미국사 산책 3』(강준만 지음, 인물과 사상사)에 따르면 존슨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집안이 워낙 가난해 정규 교육은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아홉 살 때 재단사 도제로 시작해 테네시주 주지사까지 오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그런데 노예해방을 주장하는 북부의 주요 정치인이면서 자신은 노예를 소유한 대농장주였다. 일설에 남부의 연방 탈퇴에 반대한 것은 '연방이 노예제 존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였다고 한다.
존슨은 또 정치적으로도 오락가락했다. 우선 그는 노예제를 지지하던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연방탈퇴주 상원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공화당이 주도하던 의회에 남았다. 링컨은 두 번째 대선때 남부 경계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존슨을 러닝메이트로 삼았다. 당연히 존슨은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남북전쟁 후 존슨은 해방 노예들에 대한 지원 법안을 거부하기도 하고, 흑인을 공격하는 KKK단을 방치하는 등 사실상 흑인들을 2등 국민 취급했다. 좋게 말하자면 유화책으로 남부를 포용하려는 온건파였지만 공화당 내 급진파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결정적 계기는 육군부 장관 에드윈 스탠턴 해임 건이었다. 앞서 존슨은 흑인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민권법을 거부했다가 의회에서 재의결하는 통에 '거부권이 무효화된 최초의 대통령'이란 낙인이 붙은 터였다. 존슨은 남부 흑인들의 자유민화 과정을 통괄하던 스탠턴의 해임을 벼르던 처지였다. 이를 간파한 공화당은 1867년 의회 동의 없이 장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육군 통솔법'과 '공직 보장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존슨이 스탠턴을 해임하는 강수를 두자 1868년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어, 존슨을 '배신자' 취급하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마저 가세하여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반면 상원에서는 1표 차로 간신히 부결되었는데, 이는 "탄핵이 선례가 되어 의회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긴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탈한 덕분이었다. 어쨌거나 최악의 사태를 면했지만 존슨이 대통령 출마를 꿈도 꾸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한편 여기에 씁쓸한 뒷이야기가 있으니 문제의 '공직 보장법'은 1926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를 보면 어떤 것이 정의이고, 정치적 승리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는지.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국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로 정년퇴직한 후 북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엔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초빙교수로 강단에 선 이후 2014년까지 7년 간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미디어 글쓰기를 강의했다. 네이버, 프레시안, 국민은행 인문학사이트, 아시아경제신문, 중앙일보 온라인판 등에 서평, 칼럼을 연재했다. '맛있는 책 읽기' '취재수첩보다 생생한 신문기사 쓰기' '1면으로 보는 근현대사:1884~1945' 등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