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함께 벌거벗고 씻는 시대 열려…나라 잃은 후 1924년 평양에 대중목욕탕 첫 선
한국 대중목욕탕 입구서부터 남녀구별 한 것은 일본의 '만풍'에 대한 반작용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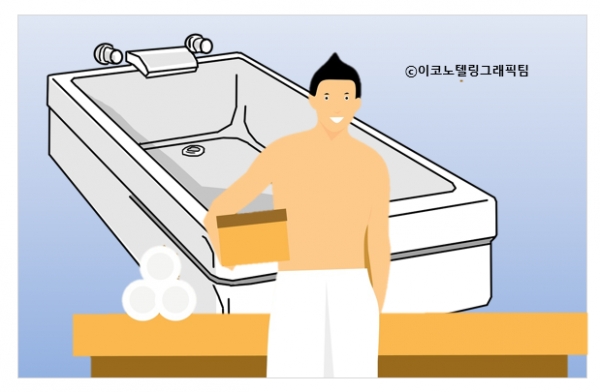
한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논쟁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럽다. 『한국 현대사 100년 100개의 기억』(모지현 지음, 더 좋은 책)은 그런 논쟁을 피하면서 역사적 흐름을 놓치지 않았기에 눈길을 끈다.
3·1운동부터 2018년 남북정상회담까지 우리 현대사에 굵직한 자취를 남긴 '사건'을 짚으면서도 영화 '아리랑' 개봉, 백화점·카페의 탄생 등 시대의 변화까지 담아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막바지 더위가 하도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절로 예전 등목이 생각나 그중 '대중목욕탕의 등장'을 들춰 보았다.
우리 역사에서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목욕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왕비 알영의 목욕이라고 한다. 불교를 신봉하던 신라 시대에는 목욕재계를 위해 절에 대형 공중목욕탕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귀족층 여자들이 난초를 삶은 난탕을 이용할 정도로 목욕문화가 한결 사치스러워졌단다.
조선 시대에도 유교 사상에 따라 제례 전에 목욕재계하는 관습이 성행해 서민들은 냇가나 헛간 등에서, 양반층은 목간통이라 불린 '욕조'를 이용했다고 한다. 단, 노출을 꺼려 벌거숭이로 목욕하지 않고 옷을 입을 채로 씻었다나.
여러 사람이 꾀벗고 함께 씻는 대중목욕탕이 등장한 것은 일제에 의해서였다. 습한 기후 때문에 목욕이 생활화된 일본인들이 이 땅에 상륙하면서 1905년경 서울 서린동 근방에 다방과 이발소를 겸한 초기의 목욕탕 '수월루'가 등장한 데 이어 '목욕집'이 속속 개업했다.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긴 후 이른바 '내지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924년 평양에서 본격적인 대중목욕탕이 처음 선보였다. 이는 부(府)에서 직접 관리인을 두어 사용료를 받고, 입욕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종의 공영 목욕탕이었다.
경성에선 이듬해에야 공중목욕탕이 등장했는데 한국인들의 거부감은 만만치 않았다. 당시 일본의 대중목욕탕은 입구만 달랐을 뿐 남녀 구별이 없었으니 당연했다. 물론 남자들이 사용하고 나오면 여자들이 교대로 들어가는 식이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만풍(蠻風)', 즉 오랑캐 풍속이라 경멸했다.
그러니 이런 해프닝이 생길 수밖에. 1920년 『동아일보』 기사다.
"지나간 3월 그믐날 저녁…적선탕에서…경성부청에 다닌다는 한 일인 관리가 남탕은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 없다고 핑계하고 여탕으로 발가벗고 들어갔다. 그때에 목욕하던 여탕의 여자들은 놀라 뛰어나왔다…그 동네 사람들은 기막혀 말하되…세계 각국 어느 문명한 곳에 그런 풍속이 있을까 하며 목욕탕 주인의 묵인함과 당국의 취체 완만함을 분개하더라."
한국 대중목욕탕은 입구에서부터 남녀 구별을 철칙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온 것은 그 일본의 '만풍'에 대한 반작용인지 모르겠다.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국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로 정년퇴직한 후 북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엔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초빙교수로 강단에 선 이후 2014년까지 7년 간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미디어 글쓰기를 강의했다. 네이버, 프레시안, 국민은행 인문학사이트, 아시아경제신문, 중앙일보 온라인판 등에 서평, 칼럼을 연재했다. '맛있는 책 읽기' '취재수첩보다 생생한 신문기사 쓰기' '1면으로 보는 근현대사:1884~1945' 등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