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5월 재조립한 직기4대 기숙사에 설치, 적막 감돌던 공장에 활력 넣어
전쟁 내내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풍요로운 행복' 희망의 싹 틔워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쓸모없는 공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과 상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곳에서 유독 강한 의지를 불태우는 이가 있었다. 스물여덟 살의 청년, 최종건. 그는 남들과 달리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폐허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던 것이었을까.
선경직물은 경성직업학교를 졸업한 최종건이 열여덟 살부터 일한 곳이었다. 해방 후에는 일본인들이 떠난 뒤 적산이 된 상황에서 멈춰 있던 공장을 재가동시키며 청춘을 바친 직장이었다.
생산부장을 맡아 자신을 따르던 직원들을 아우르고, 틈날 때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일하던 곳이었다. 비록 관리인들도 외면해 버렸지만, 선경직물은 그에게 단순한 폐허로만 보이지 않았다.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각오가 피어올랐다. 청춘을 바친 삶의 터전을 재건하겠다는 굳은 다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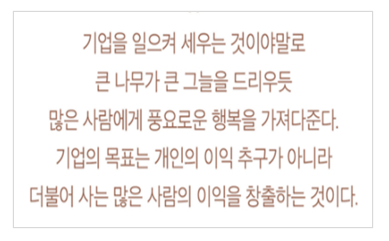
"반드시 선경직물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렇게 되면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고 빈둥대는 벌말의 많은 젊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최종건은 삽으로 잿더미를 헤쳐 나갔다. 당시 선경 직물은 피폭으로 제1공장과 제2공장은 완파되었고, 기숙사는 반파된 상태였다. 벽돌 한 장, 나사못 하나까지 소중히 추려 모았다.
쓸 만한 부품은 직기 조립에 쓰고, 불에 녹은 것은 고철로 팔아 부품 값을 마련했다.
어느덧 소문이 퍼져 과거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인근 광교천에서 자갈과 모래를 실어 와 벽돌을 찍어 기초를 닦고, 철골과 파이프를 잘라 뼈대를 세워 기숙사 건물을 복구했다.
1953년 5월 초순, 흩어진 직기 부속품을 모아 재조립한 직기 4대가 기숙사에 설치되었다. 이어 새로 조립한 직기까지 포함해 총 15대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다. 잔고장이 심하던 직기들의 고장 빈도가 줄어들면서 공장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기계는 매끈한 인조견을 척척 짜내기 시작했고, 쌓인 인조견은 곧바로 팔려 나갔다. 최종건은 그렇게 전쟁 내내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의 싹을 틔워 주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