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줬던 현지 교회 모임서 '한국의 남녀차별' 질타에 욱하는 답변
지원 끊기자 미주리대서 오하이오주 애크런대 대학원으로 학교 옮겨
광활한 곡창을 가진 미국을 보고 돌아온 그의 눈에 비친 '조국의 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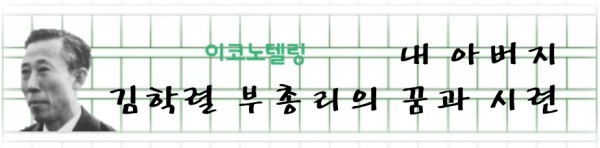
쓰루는 1952년 12월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떠났다. 영국 옥스퍼드대로 떠난 이기준 전 경제과학심의회의(經濟科學審議會議) 위원 겸 한국개발연구원 이사장이 국비 장학생 동기다.
당시 정부의 규정으로는 공무원은 1년 이상 유학할 수 없었다. 석사까지는 마치고 싶었던 그로서는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유학 기간 연장을 두고 힘들었던 그때의 경험 때문이었을까. 훗날 자신이 부총리가 되었을 때 아끼는 후배 관료가 유학을 가서 정부가 정한 기간을 넘겨 더 공부하고자 하면, 그답지 않게 관대하게 처리했다.)
그는 미국에서 미주리 주립대와 오하이오주 애크런대 대학원 두 군데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럴 사연이 있었다. 당시 국비 장학금은 나라 사정처럼 말 그대로 쥐꼬리만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교회 등을 통해 추가 장학금을 받아야 했다. 그도 미국 유학을 떠날 때부터 미주리주의 어느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그가 미국 유학 중 배우고 느낀 것 등을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다. 발표까지는 아무 탈이 없었다. 발표 뒤 받은 질문이 문제였다. 질문의 요지는 "왜 너희는 아직도 남녀 차별을 하느냐"였다. 비록 자신의 집은 사실상 여성 상위 부부관계여서 김 여사에게 여러 가지로 눌려 지내는 처지였지만, 동양인을 무시하는 듯한 서양인의 비아냥거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동양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서양, 특히 미국에서 여성을 지나치게 우대하기 때문에 동양의 남녀관계가 차별적으로 보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같은 서양인데도 미국은 유럽보다 여성을 더 우대한다.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죽지 않고 몸 성하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할 수 있느냐가 불확실한 개척시대에, 과연 멀쩡한 여성이 몇이나 미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겠느냐? 그런 여자 중에 미국에 무사히 도착한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남성에 비해 극소수였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인의 눈에도 지나친) 북미의 독특한 여성 우위 문화가 탄생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아무리 자선이 생활화되어 있고 관대한 미국 중부라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하는 유학생에까지 자선을 베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교회 장학금이 끊긴 그는 오하이오주 애크런대 대학원이라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밖에 없었다. 그 기억 때문인지, 그가 미국 유학시절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어쨌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더욱 경제학 공부에 진력하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이었던 셈이다.
세계인을 먹여 살리는 광활한 곡창과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목격한 후 그가 귀국한 조국은 3년 전 유학을 떠날 때의 가난한 모습 그대로였다.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저지른 6·25 전쟁은 안 그래도 가난에 찌든 개도국을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처참한 빈사경제로 갈아엎어 놓았다. 이 전쟁으로 주요 제조업 시설의 40% 이상이 부서졌고, 제조업체의 절반이 사라졌다.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거리는 고아와 과부, 상이용사, 실업자로 넘쳤다.
1952년 말 실업자 126만 명은 노동인구의 8분의 1에 해당했다. 휴전을 맞이한 1953년의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67달러였다. 해방 전 1940년과 비교해서 44%나 줄어든 수준이었다. 해방과 동시에 미 군정의 원조를 받아오던 한국 경제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경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