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못하는 사람은 쓰지 말것이며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용인철학 실천해
1970년대 말 당시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 직원 출퇴근 카드제 '도 폐지

최종현은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했다. 그는 직접 결재하지 않고 계열사 사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 그는 그룹 회장은 계열사의 실무를 챙기는 대신 1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항상 "사장에게는 사장이 할 일이 있고, 회장에게는 회장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의 오랜 신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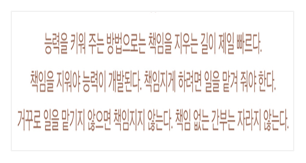
최종현은 사장을 포함한 계열사 임원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사 활동도 아예 없앴다.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애당초 계열사 사장으로 쓰지 말고 만일 사장으로 앉혔으면 최대한 그를 믿고 지원해야 한다는 최종현의 용인(用人) 철학은 중국의 사서 <송사(宋史)>에 나오는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 믿지 못하는 사람은 쓰지 말 것이며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에 부합한다.
오랜 지기인 홍사중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와 같은 최종현의 철학을 중국의 고전 <안자춘추(晏子春秋)>에 나오는 '국유삼불상(國有三不祥)', 즉 나라를 망치는 세 가지 불길한 징후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것은 "인재가 있어도 알지 못한다면 첫 번째 불상(不祥, 불길한 징후)이다. 있는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다면 두 번째 불상이다. 쓰면서 맡기지 않는다면 세 번째 불상이다."라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영 방침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1970년대 말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직원 출퇴근 카드제를 없앴다.
자율적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부서장은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라는 취지였다.
좀처럼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것은 다른 기업과 비교되는 선경의 조직 문화였다. 사람을 자주 바꾸면 불안감 탓에 눈앞의 이윤 추구에만 열중하게 되고 결국 자발적이지 않은 노력은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가 자주 사용한 "나는 사람을 사지, 머리만을 사지 않는다."라는 말은 개인의 전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이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