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사직서 받고 위촉 기간 명시된 임원 위촉 계약서 작성이 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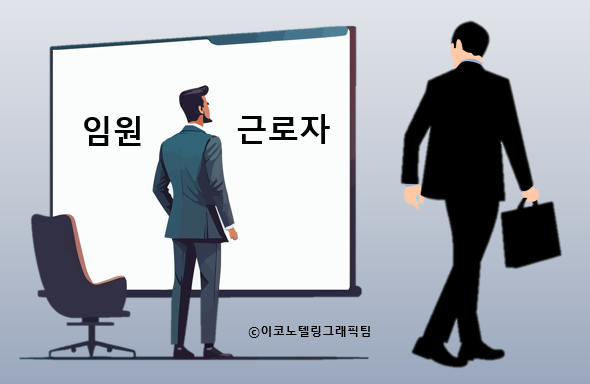
요즘 A 회사의 B 사장은 C 상무의 퇴직금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3년 전에 당시 부장이었던 C를 상무로 임원 승진시키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모두 지급했다.
그리고 보수도 다른 일반 직원보다는 올려 지급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C상무를 해임하자 C상무는"자기는 회사 지시로 임원이 됐을 뿐이고 하는 일은 직원과 똑같았다"면서 퇴직금을 처음 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계산해서 정산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자신은 임원이 아닌 근로자였다"는 주장이다. C상무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대개의 회사는 그 구성원이 크게 임원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승진을 하여 최종적으로 임원이 되는 것이 꿈이지만 노동법적 측면에서 보면"직원"은 회사의"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만"임원"은"회사의"위임"을 받아 담당 분야에 대한 업무 자율성과 특별한 처우를 받는 대가로 직원들이 받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가"이제 그만둬라"하면 언제든지 회사를 떠나야 한다."임원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노동법적으로는 회사에서 불렸던 호칭과 관계없이 직원인지 임원인지가 그리 명쾌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회사에서 직원이 임원이 됐지만 사실상 기존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는 처우를 받고 업무도 비슷하게 했다면"이들의 호칭이 단지 임원이라고 해서 노동법이 그 보호를 배제하는 게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위의 C상무 사례도 그런 경우이다.
첫째, 우리 법원은"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체로 근로자성을 부인한다. 하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다."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단지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된 것에 지나지 않고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이사로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이다"라는 판례에서 보듯 형식적으로만 등기되어 있는 임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둘째,"비등기임원"의 경우는 여러모로 따져봐야 한다. 최근 기업은 여러 이유로 가급적 등기이사의 수를 줄이고 등기이사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비등기임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의 오너들도 등기 임원이 아닌 비등기임원인 경우가 많다. 선임된 비등기임원이 1) 사용자와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면서"임원위촉계약"을 맺고 2) "독자적인 업무집행권" 즉 회사의 특정 업무를 총괄 운영하면서 집행도 자기 권한으로 하고 3) 직원과는 다른 차별화된 처우(차량, 독립사무실, 비서 등)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인정되어 노동법적 보호가 배제된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에서 임원으로 불리었지만 1) 직원 시절과 비슷한 업무 영역을 맡으면서 2) 매일 똑같이 출근하여 오너의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일이 보고하는 등 업무의 자율성이 없었고 3) 처우도 급여의 소폭 인상 외 차량 지급 등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다면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회사의 해고권도 제한되고 퇴임 시 퇴직금도 임원이 된 시점이 아닌 처음 입사 시점부터 다시 정산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 시 기존 근로관계를 명확히 종료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임원으로서의 위촉기간이 명시된 임원위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C상무와 같은 사례를 방지 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